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da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산과 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인 ‘2020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가 지난 14일 온라인 상에서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데이터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여 디지털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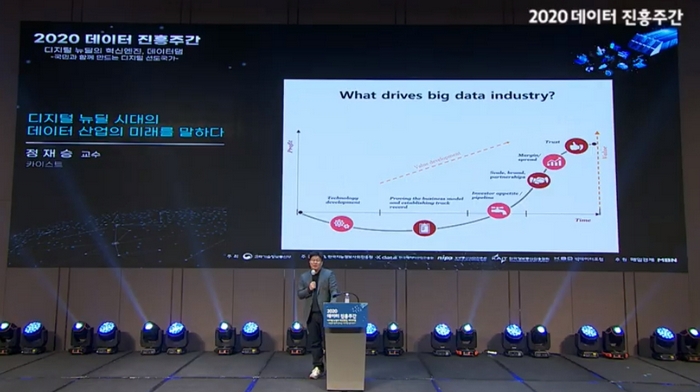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da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산과 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인 ‘2020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가 지난 14일 온라인상에서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데이터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여 디지털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디지털 트윈은 아톰과 비트의 접점
‘디지털 뉴딜 시대의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정재승 KAIST 교수는 최근 자신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전하면서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모든 현상을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화해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통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말했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시스템, 또는 환경 등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가상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분신을 만드는 것이 마치 쌍둥이 같다는 뜻에서 이 같은 명칭이 붙여졌다.
‘동일하게 구현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형상만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작까지 똑같이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은 모니터링과 운영, 그리고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정 교수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을 표현하는 ‘아톰 세계(atom world)’와 ‘비트 세계(bit world)’를 소개했다.

아톰 세계는 물질로 가득 찬 오프라인 세계를 물질의 기본단위에 빗대어 부르는 표현으로서, 전통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세계다. 따라서 아톰 세계에서 경제를 지배하는 3요소는 토지와 자본, 그리고 노동이다.
반면에 온라인 세상인 비트 세계는 아톰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 활용되는 공간이다. 비트 단위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공간을 점유하지도 않고, 처리하는 속도도 아톰 세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다.
정 교수는 “비트 세계가 놀라운 점은 무엇보다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히며 “이것을 ‘한계비용 제로(marginal cost zero)’라고 부르는데,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은 2배~3배가 아니라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톰 세계와 비트 세계가 일치하는 디지털 트윈은 실로 혁명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톰 세계의 오프라인 공장을 디지털화시켜 온라인에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인공지능(AI)을 이용해서 저비용 고효율로 공정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I와 융합한 데이터는 양면의 칼날 같은 존재
디지털 트윈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구는 AI라는 것이 정 교수의 생각이다. 아톰 세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비트 세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작업은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AI는 사진 속 얼굴만으로 신상명세를 정확하게 식별하는가 하면, 의료데이터를 통해 숙련된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다. 최근의 AI 스피커는 빅데이터로 학습해서 웬만한 사투리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졌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회성까지 갖추고 있다.
문제는 AI의 지능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 데이터 보안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드론 개발 기업은 대부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들 드론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찍은 모든 사진들을 자사 서버로 전송하여 보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정 교수는 AI 스피커도 데이터 보안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AI 스피커는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듣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는 “AI 스피커를 침실에 두면 침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리를 엿듣는다”라고 지적하며 “AI 스피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알아채기 위해서는 계속 듣고 있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시사잡지인 뉴스위크는 '아마존의 AI 스피커인 알렉사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아마존 관계자는 ‘알렉사라고 이름이 불린 이후부터 AI가 추론에 들어간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공개했다.
정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데이터를 한데 모아 생기는 사생활 침해나 데이터 보안 이슈들도 점점 더 골치를 썩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예전에는 고민의 대상도 아니었던 데이터 보안 문제가 AI까지 결합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정 교수는 “이런 많은 위험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 전체가 인식하여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김준래 객원기자
- stimes@naver.com
- 저작권자 2020-12-15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