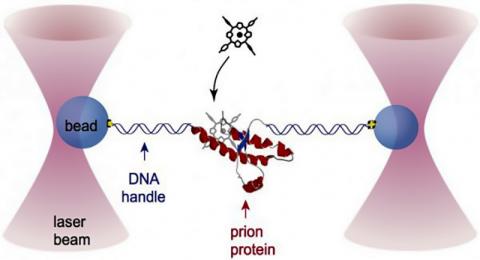자연의 진화에는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가장 가능성 있는 경로를 따라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우연한 돌연변이로 인해 새로운 진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진화의 지속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생물종은 도태된다. 그러면 진화에서 가능한 경로와 불가능한 경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자연 진화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는 이론물리학의 모델과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를 미국물리학회 기관지 ‘물리학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 5월 26일 자에 발표했다.

질서 있는 낮은 차원
이론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의 전체 화학적 구성 성분은 독립적으로 다 다를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높은 차원(high dimensionality)’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진화는 가능한 결과를 모두 생성해 내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유기체들이 낮은 차원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해 왔다. 이는 유기체의 필수 구성요소가 상호 연결돼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하는 것이다.
논문 시니어 저자이자 도쿄대 복잡 시스템 생물학 연구센터 이론 생물학자인 구니히토 가네코(Kunihiko Kaneko) 교수는 “박테리아는 수천 종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천 개의 차원 점(dimensional points)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박테리아 변이가 1차원 곡선 혹은 저차원 표면에 적합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런 낮은 차원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 세계를 이상적인 물리 모델에 맞게 단순화하고, 생물학적 복잡성 안에 어떤 수학적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통계 물리 모델을 활용해 어떤 물질이 비자성(nonmagnetic) 상태에서 자성 상태로 전이되는 것을 특성화해 왔다.
이 모델들은 자석에 있는 회전하는 전자의 단순화된 표현을 사용한다. 만약 스핀이 정렬되면 스핀 앙상블은 질서 있는 자성 배열을 나타낸다. 반대로 스핀이 정렬 상태를 잃으면 무질서하며 비자성인 상태로 전환된다.

연구팀의 생물학 모델에서는 스핀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신 유전자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논문 제1저자인 도쿄대 통계 수학 연구소 아야카 사카다(Ayaka Sakata) 부교수는 “우리는 동일한 방법을 이 실험에 적용해, 무질서한 고차원 상태로부터 질서 있는 낮은 차원으로 옮겨가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관찰했다”고 밝혔다.
“적당한 환경 노이즈 아래에서 유기체 진화”
이런 통계 물리 모델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배경 노이즈(noise)로서, 이는 고요하고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시끄럽고 완전히 압도적인 힘을 가진 고유의 예측불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노이즈는 유전자 발현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환경적 변이를 나타내 쌍둥이나 복제되는 식물처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유기체들 사이에서 다른 유전자 발현 패턴을 유발한다.

연구팀의 수학 모델에서 환경 노이즈의 양을 변경하자 진화적 복잡성의 차원 수가 변화됐다.
낮은 환경 노이즈 아래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수백 개 유전자의 진화는 높은 차원성의, 조직화된 변화 없이 너무 많은 방식으로 변화한 가지각색의 유전자 발현을 초래했다.
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경 노이즈 아래에서 시뮬레이션된 진화는 유전자 발현이 무작위로 변화하는 높은 가변성을 나타냈다. 이는 유전자 발현에 어떤 조직화나 기능적 상태가 없음을 의미한다.
가네코 교수는 “우리는 위와 같은 극한적인 노이즈 조건에 있는 유기체들은 진화적으로 적합지 않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 유기체들은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멸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노이즈가 적당한 수준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된 유전자 수백 개의 진화는, 실생활에서 보듯 유전자 발현에서의 변화가 1차원 곡선을 따르는 모델로 나타났다.
가네코 교수는 “적당한 환경 노이즈 수준에서 환경에 강하고 민감한 유기체가 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병희 객원기자
- hanbit7@gmail.com
- 저작권자 2020-06-02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