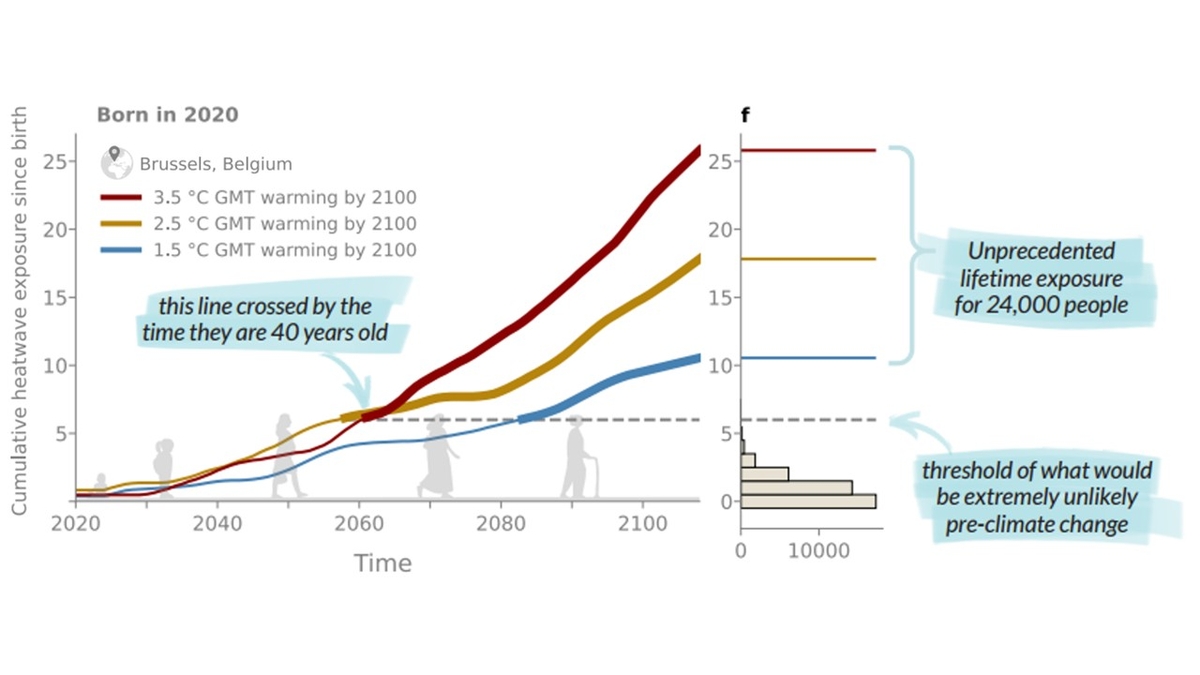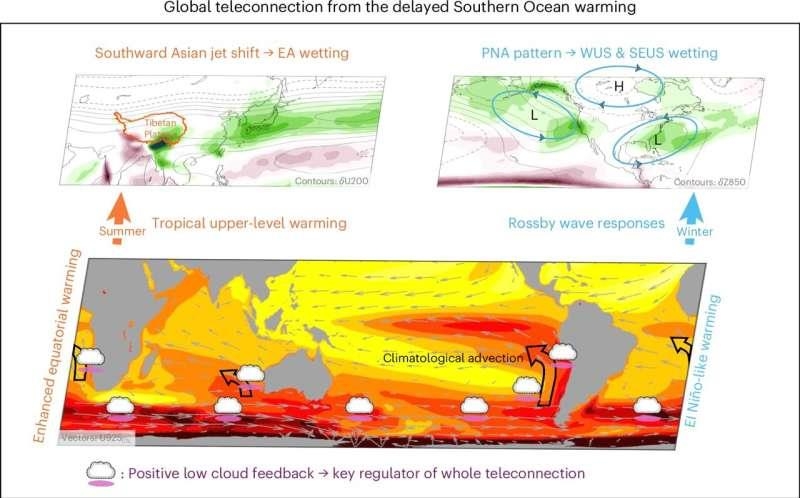지구 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지역이 서남극이다. 서남쪽 아문센 해에 인접한 스웨이츠 빙하(Thwaites Glacier)는 1980년대 이후 약 5,950억 톤에 이르는 얼음이 녹아 사라졌다.
지난해 4월 ‘사이언스 어드밴스’ 지에 게재된 논문 ‘Pathways and modification of warm water flowing beneath Thwaites Ice Shelf, West Antarctica’에서는 이 때문에 전 세계 해수면이 4%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남쪽으로 갈수록 지열 더욱 높아져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 종말의 날을 암시하는 ‘둠스데이 빙하(Doomsday Glacier)’란 별명으로 불리어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학자들은 서남극이 이처럼 빨리 녹는 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해왔다. 그리고 더워진 바닷물이 빙하 아랫부분을 가로질러 쪼개는 등 대기와 바닷물에 의한 다양한 빙하 붕괴 과정을 발견해 보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와 바닷물뿐 아니라 지구 지각 위로 발산되고 있는 열기가 서남극 빙상을 더욱 빠르게 녹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AWI)와 이탈리아 OGS 연구소는 그동안 다른 빙하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스웨이츠 빙하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열의 흐름을 분석해왔다. 그리고 남극 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자기장 데이터를 분석해 서남극 지역의 지열 흐름에 대한 새로운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에 따르면 빠르게 소멸하는 스웨이츠 빙하 아래 지열이 다른 지역 지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이런 결과가 서남극 빙상 밑에 있는 취약한 암석권의 역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서남극 대륙 아래의 지각이 동남극 대륙보다 훨씬 얇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남극 대륙이 약 17~25km 두께로 동남극 대륙 약 40km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남극보다 서남극 대륙에서 훨씬 더 많은 지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남극 빙하가 빠르게 녹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논문은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즈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18일 자에 게재됐다. 제목은 ‘High geothermal heat flow beneath Thwaites Glacier in West Antarctica inferred from aeromagnetic data’이다.
서남극 지각의 두께 동남극의 절반 수준
최근 전 세계 해수면의 상승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서남극 빙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점은 서남극 빙하가 완전히 붕괴할 경우 지구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다른 빙하에도 영향을 미쳐 남극뿐만 아니라 북반구 빙하까지 더 빨리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서남극 빙상이 붕괴하면 해수면이 평균 5m가 상승하고, 북극해 빙산이 10년 주기로 3~4%씩 줄다가 21세기에 들어서는 8% 비율로 빠르게 녹는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서남극이 왜 그렇게 빨리 녹고 있는지 그 원인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남극 빙상이 심해저에서 움푹 들어간 해구에 있기 때문에 동남극 등 다른 남극 지역 지각보다 훨씬 얇다는 것.
이에 따라 서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왜 그처럼 빨리 녹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이 비교적 얇은 지각이 다른 지각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수백만 년에 걸쳐 빙하의 형성과 진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남극 전역을 대상으로 지각과 맨틀 사이의 거리와 해당 지역의 상대적 열 흐름을 계산했다. 그리고 서남극과 동남극 지열 흐름의 차이를 정량화해 지열의 차이가 지각, 특히 빙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다.
AWI(Alfred Wegener Institute)의 지구 물리학자인 리카르다 지아덱(Ricarda Dziadek) 박사는 “측정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 두께가 17~25km인 서남극에서 1제곱미터당 최대 150밀리와트(mW/m²)의 지열 열 흐름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극 전체적으로는 50~230mW/m²의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높은 지열 열 흐름 밴드는 스웨이츠 빙하를 중심으로 한 서남극을 향해 뻗어 있으며 이 높은 열 흐름 대역은 50~80mW/m² 범위의 낮은 GHF 값에 의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AWI의 지질학자이자 공동 저자인 카르스텐 골(Karsten Gohl) 박사는 “많은 양의 지열이 완전히 얼지 않거나 표면에 일정한 물막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빙하의 얼음이 지면 위로 더 쉽게 미끄러지도록 해 빙하의 얼음 손실을 ‘상당히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이츠 빙하는 아문센 해에 접해 있는 비정상적으로 넓고 광대한 남극 빙하다. 과학자들은 이 빙하가 완전히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65센티미터 상승해 전 세계 해안 지역 사회가 파괴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스웨이츠 빙하를 서남극 빙상의 약한 하복부라고 호칭하면서 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더워진 대기와 해수 외에도 지열까지 가세해 빙하를 더 빨리 소멸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우려는 더욱 깊어지는 중이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hanmail.net
- 저작권자 2021-08-25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