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향성과 속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세상의 다양한 분야들이 각자 나름의 방향성과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에 일구난설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21세기의 강산을 두 번째 갈아치운 2020년은 곁눈질을 허락받지 못한 경주마처럼 앞을 향해 달음박질치고 있다. 조금은 숨이 차오를 정도로.
이런 속도감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것들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싶다면 곽영직 교수의 '인류문명과 함께 보는 과학의 역사'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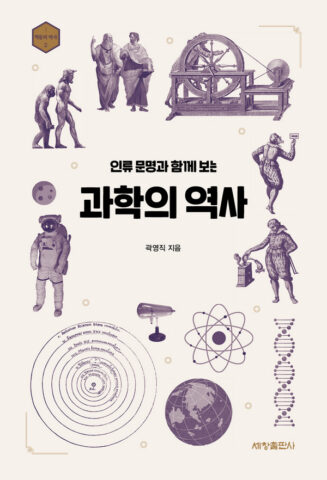
인류 역사와 함께 보는 과학의 역사
이 책은 과학을 인류 역사가 만들어 낸 인류 문명의 산물로서 접근한다. 따라서 저자는 우주, 지구, 생명체,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빅뱅’에서부터 인류 문명의 태동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근대·현대의 과학과 철학 등 철저히 인류사적 호흡을 놓지 않는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책 내용은 인류 문명의 태동기부터 시대를 기준으로 과학과 철학의 인류사를 보여준다. 그리고 과학혁명의 기반이 마련된 16세기 이후는 각 세기별,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적 이슈를 상세히 실어 역사의 묵직한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다.
인류 역사는 과학을 발전시킨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은 주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실용적 학문이 되었다. “100년 동안에 현대 과학이 이루어 낸 변화는 350만 년 동안의 변화보다 훨씬 컸다.”는 주장이 생경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일 것.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변화, 즉 과학과 기술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효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참혹한 전쟁에 과학기술의 파괴적 속성이 드러났고, 이용되었음을 입증하며 “과학기술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5억 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번의 대규모 생명 멸종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어쩌면 지구는 인류 문명을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인간은 살아남기 위한 필요성, 그리고 탐험과 모험을 좋아하는 유전자 때문에 지구를 대체할 공간으로 우주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차차 갖추게 될 것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는다.
마치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지구의 곳곳으로 진출한 이유가 한 지역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팽창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야 했다는 것. 그리고 미개척지를 향한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켰다는 것과 같은 흥미로운 논리다.
인류의 수 많은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이 책의 1장에서 저자는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질문들과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따라가겠다”고 미리 포고한 바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가 포함된 태양계, 태양계가 속한 은하, 수많은 은하들로 이루어진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주는 어떤 법칙에 의해 운행되고 있을까?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세상을 이루고 있는 기본 물질은 무엇일까? 물질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생명체는 언제 어떻게 지구상에 나타났을까? 생명체는 어떻게 자손에게 유전 정보를 전해줄까? 유전 정보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발현될까? 어떻게 하면 자연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밖에도 과학에 대한 질문은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아직까지 미지의 세계는 남아 있고, 세상은 다양한 변화와 변이를 거듭할테니 말이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역사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저자가 과학에 접근하는 많은 방법 중에 역사를 택한 이유는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 역사,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은 아닐까.
아울러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인류사와 과학기술 중 후자에 무게 중심을 조금 더 주고 싶다면, 책의 챕터 중간중간 소개된 책들로 확장시켜도 좋을 듯하다.
- 김현정 객원기자
- vegastar0707@gmail.com
- 저작권자 2020-06-05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