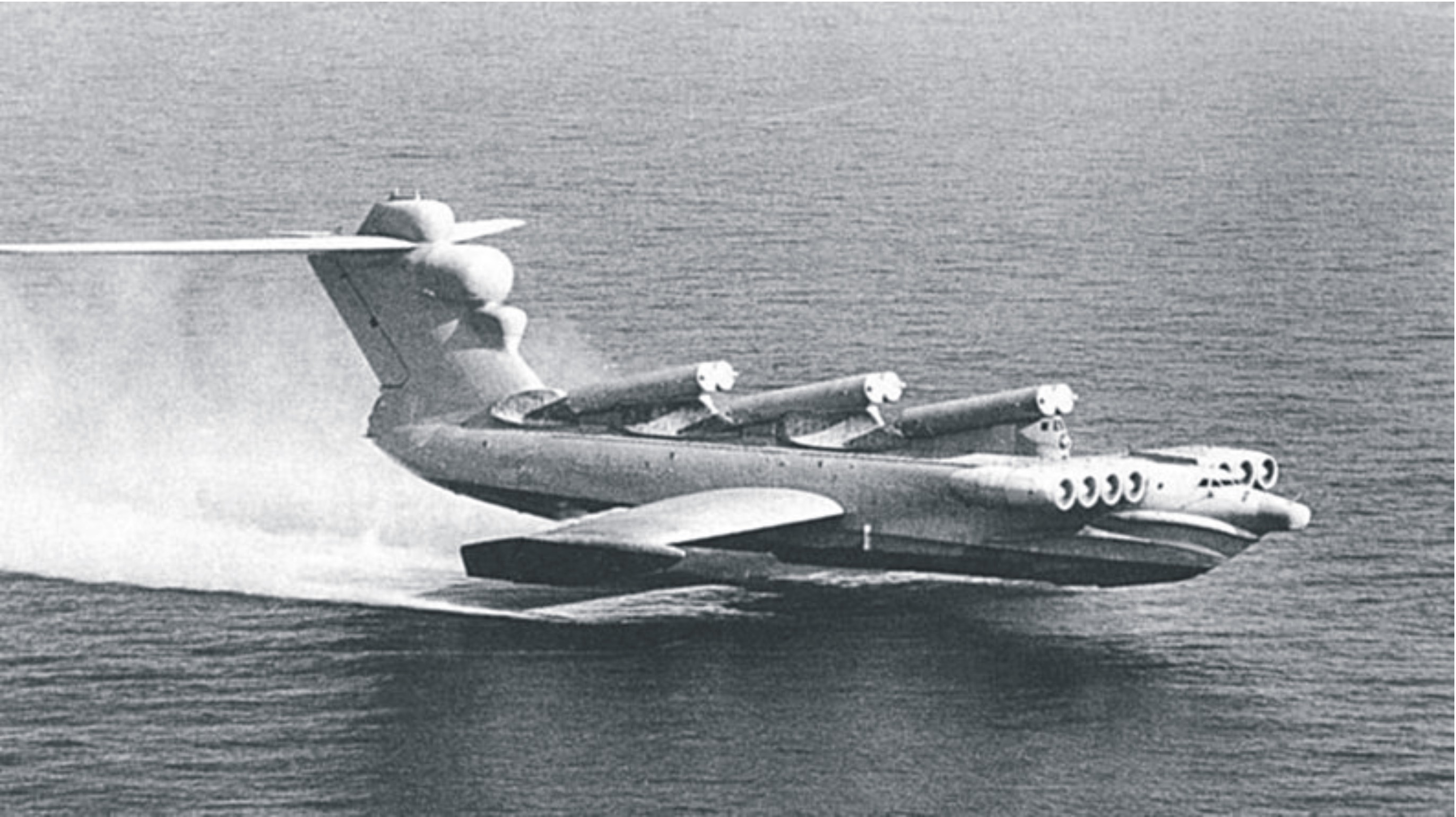“힘을 제압하는 것은 속도”라는 말도 있듯이, 전투에서 신속한 기동은 화력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할 때도 많다. 미 육군은 최소 단위의 부대인 분대(현재 미군의 편제로는 9명)에 높은 기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분대원 전원이 탑승하고 거친 지형을 기동할 수 있는 보병 분대 차량(Infantry Squad Vehicle: 이하 ISV)을 GM 디펜스와 함께 개발 중이다. 이 차량은 지난 11월 8일, 미국 국방부 차관 캐서린 힉스의 시승 영상이 트위터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좌석 배치는 제1열과 2열에 전방을 향해 각각 2명과 3명이 앉고, 제3열은 후방을 향해 2명, 좌측과 우측을 향해 각 1명씩이 앉는 방식이다. 이로써 탑승자 전원이 360도 전방위를 다 볼 수 있다. 운전석 바람막이를 제외하고는 창문이 없고, 문도 없다. 때문에 빠르게 승하차할 수 있다.
이 차량에는 심지어 장갑판이나 총탑도 없다. 오직 기동력에만 초점을 맞춘 설계다. 물론 총탑과 소화기 거치대를 추가하고, 대신 좌석을 4개 줄인 모델도 있기는 하나, 이 모델은 아직 미 육군에서 채용할 계획이 없다.
미 육군은 ISV를 2024년 말까지는 649대, 총 2,065대를 조달할 계획이다. 앞서도 잠시 비쳤듯이 높은 방호력을 갖춘 장갑 험비나 MRAP(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vehicle, 내지뢰매복방호차량) 등과는 정반대의 개념과 형태로 만들어진 데에는 미 육군의 전술 교리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올 1월 발간된 미 육군 교범에서는 보병 여단 전투단의 역할을 “복잡한 지형에서의 하차 작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지형이란, 도심지 및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제한적 지형 및 환경 조건이 있는 지리적 영역을 말한다.
제한적 지형이란 소택지 옆의 작은 마을이 될 수도, 돌밭 가장자리의 산업 단지가 될 수도, 숲 속으로 파여진 참호망 등이 될 수도 있다. 즉 기존의 MRAP이나 스트라이커 장갑차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도보 또는 오프로드 차량으로만 접근 가능한 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ISV는 이러한 지형에 1개 분대를 싣고, 도보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정차 후 보병이 하차, 은엄폐하여 전투할 수 있게 해 주는 차량이다. 즉, 승차 전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순전한 기동 장비다.
육군은 ISV에 높은 전략 기동성도 요구했다. 즉 항공기로 운반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블랙호크 헬리콥터 및 치누크 헬리콥터의 기체 밖에 매달아 수송할 수 있어야 하며, C-130 및 C-17 수송기로부터 낙하산 투하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착지한 다음, 별도로 강하한 탑승자들이 바로 시동을 걸어 목적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ISV는 최대 1.44톤의 인원과 물자를 탑재할 수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이 차량의 부품은 민간용 픽업 트럭인 셰비 콜로라도 ZR2 차량의 순정 부품과 70%가 공유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중 20%는 민수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 차종의 튜닝 부품, 10%는 군용 목적으로 특별 제작된 부품들이다. 이는 높은 개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린 것이다.
- 이동훈 칼럼니스트
- enitel@hanmail.net
- 저작권자 2021-11-24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