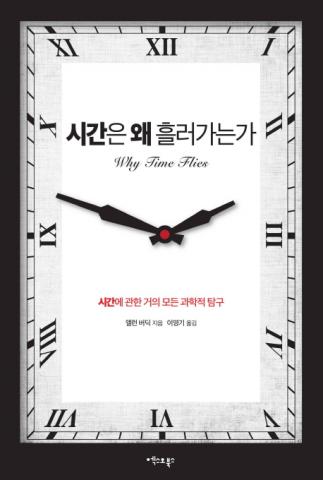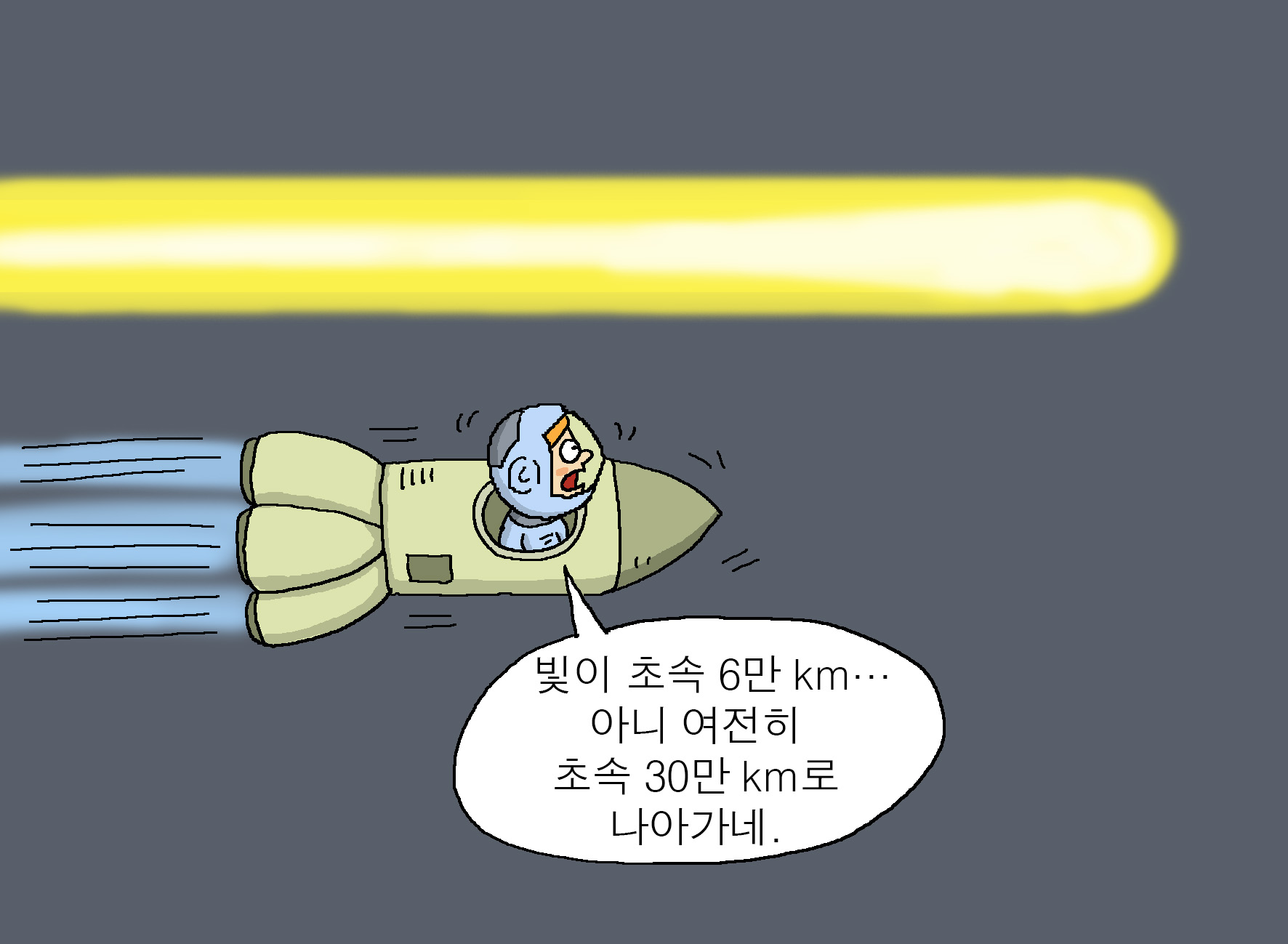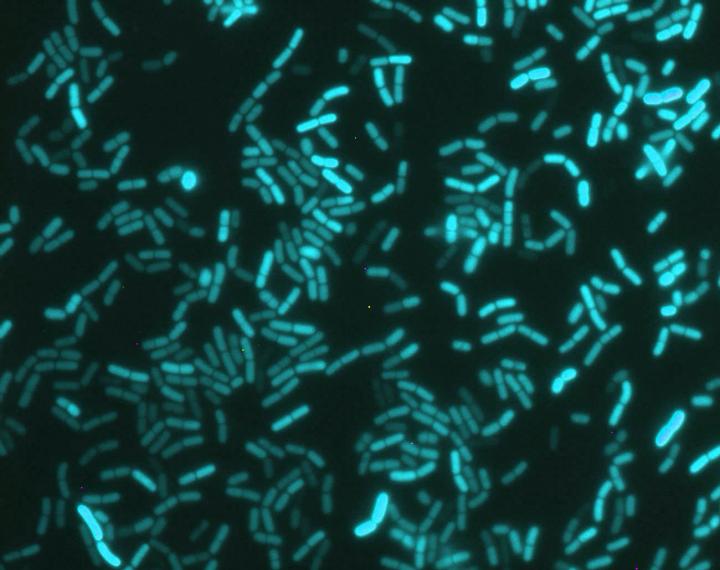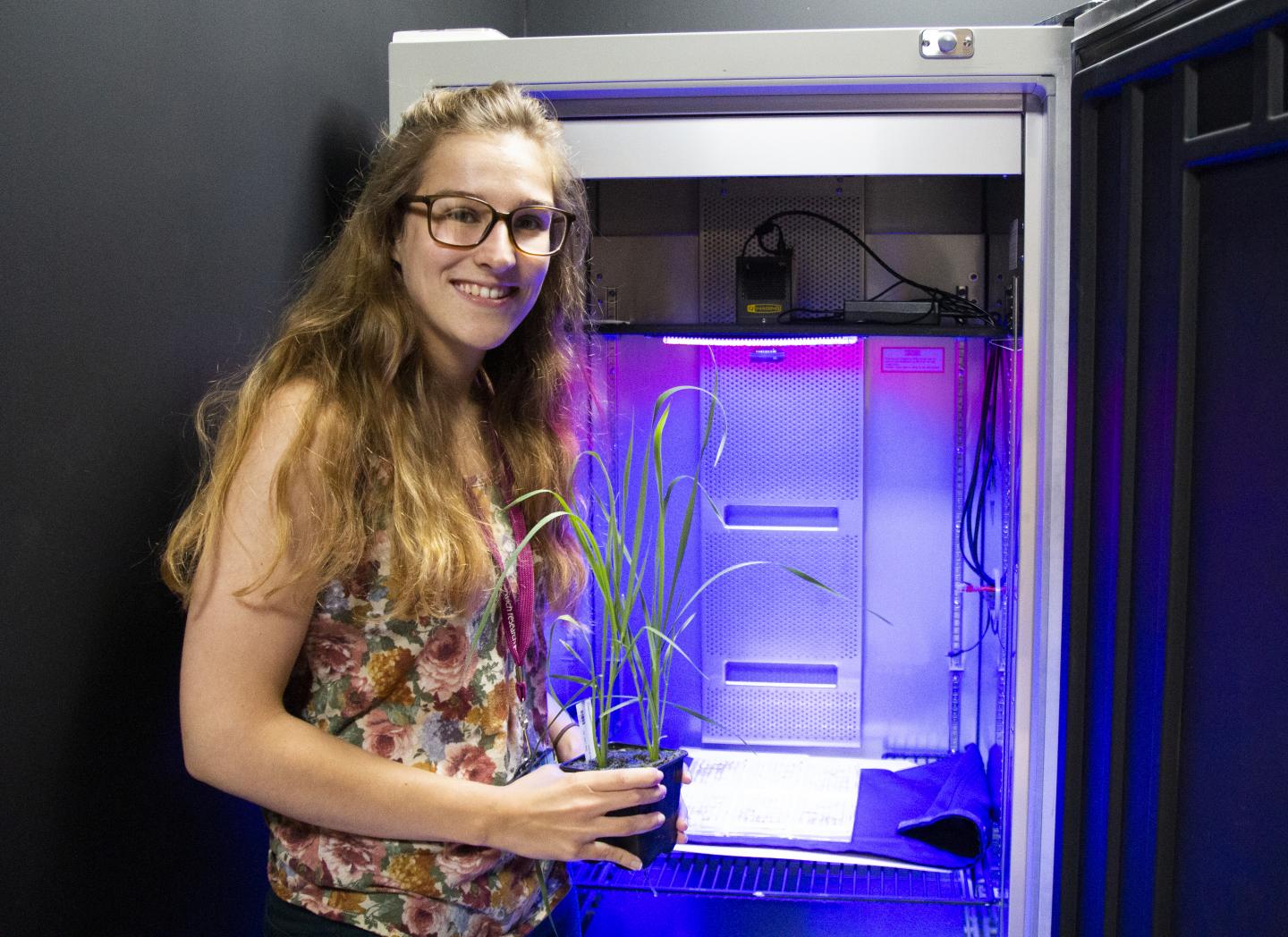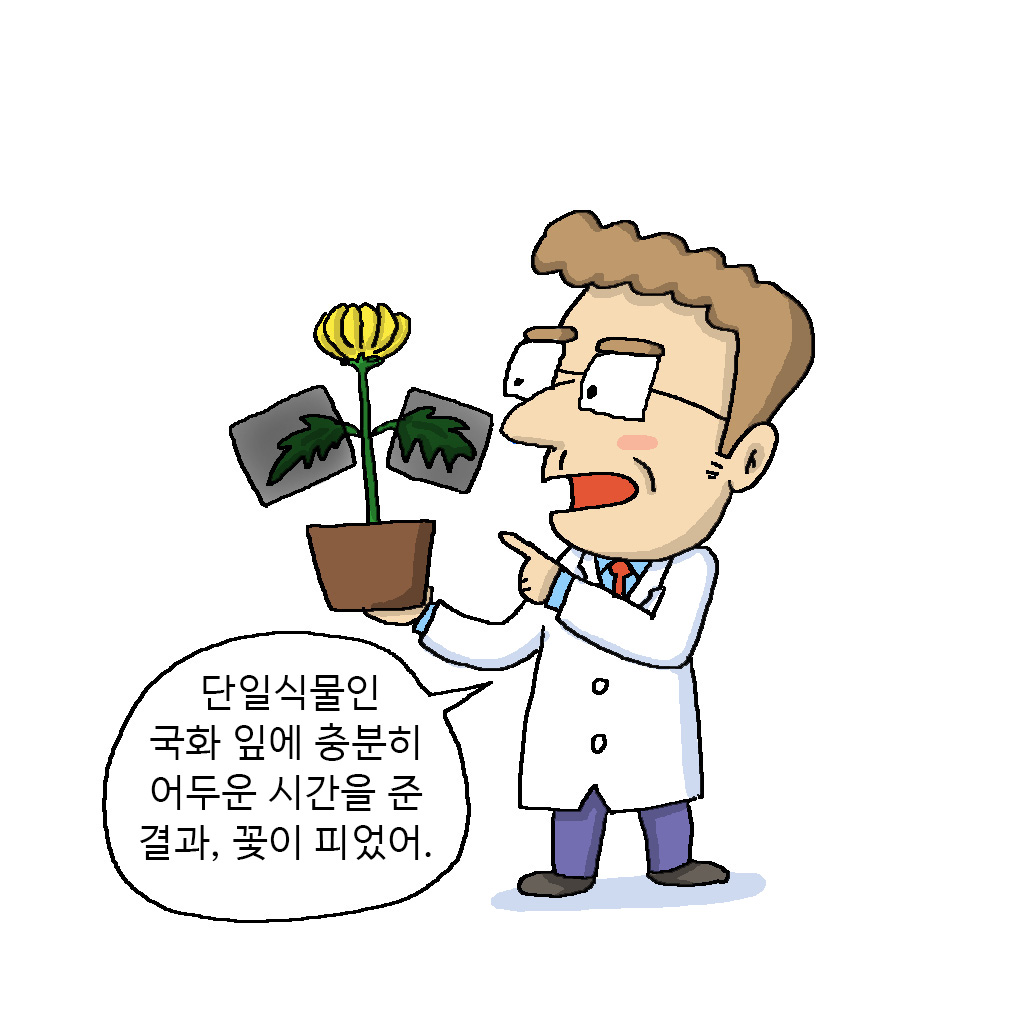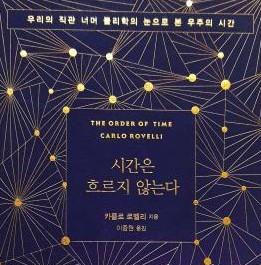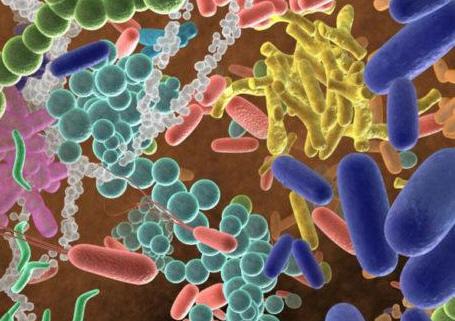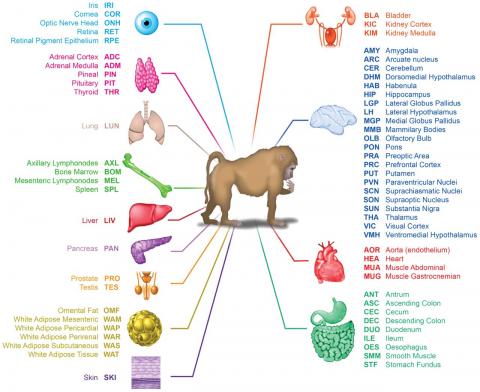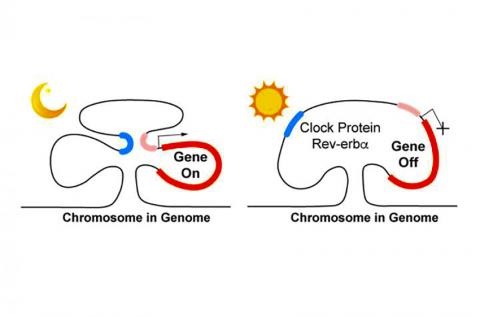나이가 들면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앨런 버딕(Alan Burdick)은 ‘시간은 왜 흘러가는가’(Why Time Flies)라는 책에서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2005년 뮌헨대 마르크 비트만 교수와 산드라 렌호프 교수는 500명의 독일 및 오스트리아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흐르고 있다고 느낍니까?
다가올 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지난 1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지난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지난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지난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14세에서 94세에 이르는 응답자들은 ‘대단히 느리게’(-2점 very slowly))에서 매우 빠르게(+2 very fast)까지 다섯 등급의 점수를 매겨야했다. 그랬더니 8개의 그룹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모든 그룹들이 ‘빠르게’(fast) 흘렀다는 +1점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지난 10년이 더 빨리 흘렀다고 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왔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고 50세 이후 연령대는 전혀 없었다. 5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10년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2010년에도 흡사한 실험이 있었다. 16세에서 80세 사이의 네덜란드 사람 17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 1주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난 10년이 빠르게(fast) 흘렀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흐른다고 느낀 것을 암시하는 지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 앞 선 실험과 비슷하게 50세가 될 때 까지 조금 높아졌지만, 50세 이후는 일정했다.
이 실험을 진행한 오벌린 칼리지의 윌리엄 프리드먼과 암스테르담 대학의 스티브 얀센은 2014년 일본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해 - 지난 주 - 지난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20세에 비해 평균 40세나 50세가 더 많지 않았다. 이런 실험을 한 사람들은 시간경험이 나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시간이 빠르게 가고 어떤 때는 느리게 간다고 생각한다.
1932년 허드슨 호글랜드는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 까지 올라간 아내에게 줄 해열제를 사러 나갔다. 호르몬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진 심리학자인 호글랜드는 20분 만에 돌아왔지만, 아내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
아내는 1초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비교적 정확한 감을 가진 음악가였다. 호글랜드는 스톱워치를 켜고 아내에게 60초를 세어보라고 했다. 열이 오른 상태의 아내가 60초를 세었지만, 실제로 스톱워치는 38초를 가리켰다. 그가 열이 올라있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높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역시 열 받으면 시간을 빠르게 인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호글랜드는 인간의 시간감각은 뇌세포의 산화적 대사(oxidative metabolism)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시간을 뇌세포의 인지 메커니즘을 통해 추적한 연구자들은 신체 안에 시간인식 장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이 시계 같은 장치인지, 아니면 사건을 인식하는 과정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열이 많으면 시간을 빨리 인식한다는 사실은 쉽게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다. 열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일을 재촉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한다.
인간에게 24시간을 감지하는 생체주기가 있다는 주장도 꼭 들어맞지는 않다. 1962년 프랑스 지질학자 미셸 시프르는 23세 때 깜깜한 빙하동굴에 들어가 살았다.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했지만, 언제 해가 뜨고 지는지 알려하지 않았다. 외부에 있는 전화로 동료들과 연락하는 정도였다. 그가 35일 동안 동굴에서 지냈다고 생각하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60일이 지나버렸다.
물론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다가 아니다. 철학자나 심리학자 혹은 신학자들이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다. 참회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에 대해 철학적 심리학적 견해를 여러번 밝혔다. 그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고 썼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술 마시고 재미있게 노는 시간은 대부분 빨리 지나간다고 대답한다. 연설하는 사람은 시간은 시간이 빠르다고 하고, 연설 듣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낀다. 시간이 지나서야 시간이 빨리 갔는지 늦게 갔는지 인식하므로, ‘지금’은 ‘나중’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시간의 근본적인 속성은 미래다’고 말했다.
시간은 심리적인 속성과도 매우 연관이 깊다. 2010년에 발표된 ‘금기단어를 읽을 때 시간이 빨리간다’(Time Flies When We Read Taboo Words)란 논문은 음란하거나 저속한 말이 더 빨리 흐른다고 발표했다.
금기단어를 논문에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저자의 요청으로 받은 금기단어는 fuck asshole 같은 것이었다. 컴퓨터 화면에서 자전거나 얼룩말 같은 단어를 볼 때 보다 금기어를 볼 때 더 빨리 흐른다고 사람들은 응답했다. 실제로는 같은데도 말이다.
열 받거나, 저속어를 보면 시간 빨리 흘러
결국 주관적인 시간은 각자가 체험하는 어떤 종류의 시간인지에 따라 다르다. 영국 킬 대학 심리학 교수인 존 웨어든은 빛이나 소리는 직접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하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광자가 망막을 때리면 망막에 있는 세포가 신경을 자극해서 신호를 뇌에 전달한다. 소리 역시 파동이 귀에 있는 섬모를 자극하면 소리 파동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 뇌가 지각한다.
그러나 아직 시간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은 없다. 사람은 시간 자체를 느끼기 보다 시간이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 지각된다. 사건은 지각되지만, 시간은 지각되지 않는다.
‘시간은 마음의 속성이다. 시간은 시간을 지각하는 인간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경험 이외의 방식으로는 결코 시간을 경험할 수 없다.’
현대 심리학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가 쓴 ‘심리학의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하는 오래된 철학적 관점을 이어오면서 지금까지도 시간에 대해 심리학적 철학적 기본 토대를 제공해준다.
과학기자 출신의 저자는 이 책의 중요한 자료출처로 줄리어스 프레이저(Julius Fraser 1923~2010)를 언급했다. 프레이저는 시간에 대한 학제적 연구에 크게 기여한 학자이다. 10권 짜리 ‘시간의 연구’ 시리즈를 발간하고 ‘국제시간연구학회’를 창설했다.
- 심재율 객원기자
- kosinova@hanmail.net
- 저작권자 2018-05-0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