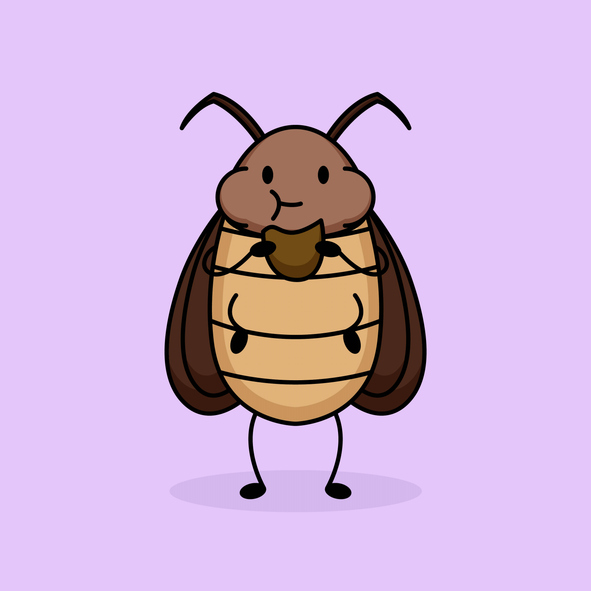지난 1월,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은 개체 수가 급감한 호박벌을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했다. 토마토, 피망 같은 작물에서 수분(受粉)작용을 해오던 호박벌은 28개주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개체 수가 많았지만 1990년대 말 이후 87%나 감소했다.
꿀벌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가 꿀벌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만 있을 뿐 개체 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2년 전부터 영국, 독일, 헝가리 3개국 33개 지역에서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토착 벌은 물론 야생 벌까지 살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국·독일·헝가리 농촌에서 살충제 실험
의외의 현상도 발견됐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꿀벌들이 ‘네오니코티노이드’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일부 꿀벌 집단들이 살충제에 적응해 독성을 견뎌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9일 ‘사이언스’ 지에 게재됐다. 연구를 수행한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의 생물학자 치어드 블락퀴어(Tjeerd Blacquière) 교수는 “살충제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며, 살충제 사용 금지조치를 놓고 논쟁이 더 격화될 것을 우려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니코틴계의 신경 자극성 살충제다. 이 살충제는 1980년대에 석유회사인 쉘이 개발을 시작했으며, 의약품 회사인 바이엘에서 개발을 완료했다. 이 농약은 나오자마자 농업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기존의 살충제보다 독성이 덜한데다 살포가 아닌 코팅 방식을 적용해 해충들이 기존 살충제처럼 내성을 키우지 못했다. 효능이 입증되면서 사용이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가 됐다.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6년이다. 미국에서 30~90%의 꿀벌이 갑자기 떼죽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미국환경보호청은 양봉업자와 지속적농업자 연합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농약에 의해 벌에 대한 위험성 관련 정보 공개를 뒤로 미루었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봉업자들은 ‘네오니코티노이드’를 원료로 한 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라’가 꿀벌 떼죽음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사인 바이엘은 농약의 부적합한 처리 때문에 꿀벌이 죽었다며, 농약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2013년에는 환경단체인 ‘ABC(American Bird Conservancy)'에서 이 살충제 성분이 무척추동물과 조류를 해친다면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헝거리·영국에서 집단 떼죽음 현상 확인
양봉업자들 역시 ‘네오니코티노이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꽃가루, 꿀에 침투한 이 살충제 성분이 꿀벌의 방향감각을 잃게 하고 꿀벌 집단 규칙에 순응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논란이 격화되면서 2013년 유럽연합은 면화씨, 해바라기씨 등 기름을 짤 수 있는 오일 시드(oil seed) 농작물과 꿀벌과 접촉하는 개화 식물을 대상으로 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사용을 일시 중지케 하는 잠정 유예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살충제 제조사들은 환경단체, 양봉업자들의 주장에 실제적인(realistic) 근거가 없다며, 사용유예 조치에 크게 반발했다. 그리고 바이엘과 신젠타는 2014년 영국 생태수문센터( Centre for Ecology & Hydrology, CEH)에 정부 자금이 투입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영국과 독일, 헝가리 3개국 33개 지역 농장에서 실사가 진행됐다. 이 실험은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이 함유된 농약 ‘티아메톡삼(thiamethoxam)’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시도됐다.
실험 결과 독일에서는 경우 꿀벌이 지속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됐다. ‘클로티아니딘’을 살포한 농장 지역에서는 오일 시드 농작물 근처 꿀벌 집단의 24%가 사라졌다.
그러나 ‘티아메톡삼’을 살포한 농장 근처의 꿀벌 집단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역시 헝가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클로티아니딘’ 살포 지역 근방에서 꿀벌 떼 죽음 현상이 발생했다.
생태수문센터의 생태학자 리처드 파웰(Richard Pywell) 박사는 “독일에 있는 꿀벌들이 다른 나라의 꿀벌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더 강인하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 야생화가 많은 점 역시 예외적인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바이엘과 신젠타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피터 캠벨(Peter Cambell) 박사는 “이번 실사 결과를 통해 꿀벌 죽음의 원인이 살충제가 아니라 나라마다 다른 자연환경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야생벌에 대한 실사 결과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벌보다 야생벌이 ‘네오니코티노이드’의 독성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땅벌과 같은 야생벌은 생식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야생벌집 안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함유된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가 검출됐는데 유럽연합에서 사용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킨 농약 성분이었다.
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이 오랜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벌집 안에 잔존해 벌 생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살충제 성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7-06-30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