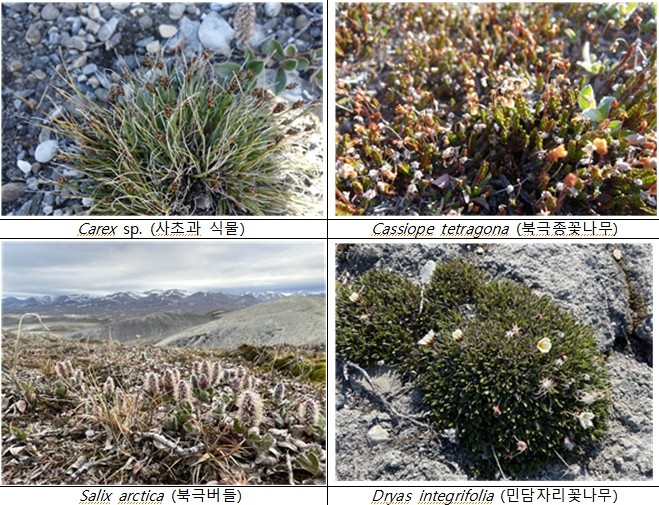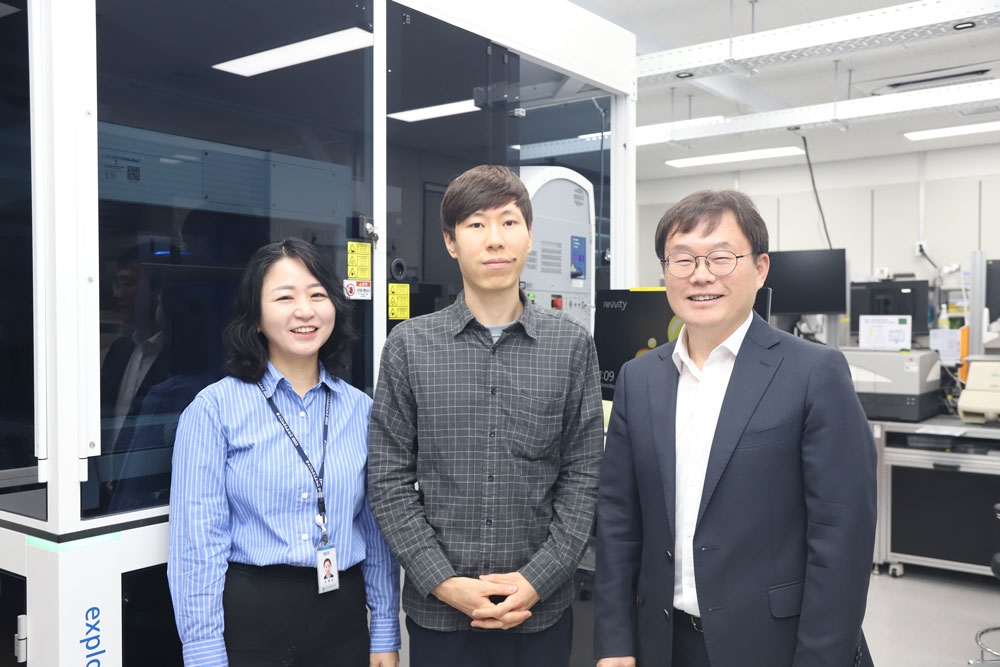저탄소, 저에너지 지향의 생활자세 필요
산업발전과 인간 생활 편의를 위한 난개발은 대량의 탄소배출로 이어져 기후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제는 기후변화(CC : Climate Change)를 넘어 기후위기(CC : Climate Crisis)를 맞는 악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남극대륙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표적인 악영향 사례로, 해수면이 급속히 상승하여 2070년쯤에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 기록적인 자연재해(폭염 및 폭우 등)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남부지방 양봉농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월동 중이던 수 많은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양봉농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과수 및 시설채소 농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량의 온실가스 발생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대형 산불발생 원인과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산불은 강력한 이산화탄소 흡수체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피해(자연과 건물 등 복구비용, 물류 파동 등 2차 피해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물론 숲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Action plan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COP21)을 통해 모든 당사국들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적응/재원/기술 등에 관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함으로써, 저탄소 및 저에너지 경제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국가(EU/미국/중국/일본/한국) 간 무역으로 인해 배출된 온실가스의 배출특징 및 수입관세에 포함된 탄소세 영향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및 저에너지 지향의 온실가스 감축은 단기적으로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상이변 현상은 기후변화가 만든 악재의 연결고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요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 부응할 수 있는 저탄소, 저에너지 지향의 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은 무엇일까?
지속가능성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시의성 있는 환경 관련 현안들이 이해당사자(정부/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시민 등)들과 잘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연계 활동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심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반으로 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과 이를 토대로 한 2050 탄소중립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Busin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설정되어야 한다.
UN이 설정한 글로벌 SDGs 콤팩트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SDGs를 기반으로 투자, 솔루션 개발 및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SDGs를 기업전략 및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SDGs의 성공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재난재해 위협요인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응만큼의 해결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만큼 기후위기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버금가는 만큼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기후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기후위기 상황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맞물리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 및 급격한 경제성장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모든 분야에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녹색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인이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숙원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전 인류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박세환 ㈜기술법인 엔펌 전문위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박세환
- 저작권자 2022-07-25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