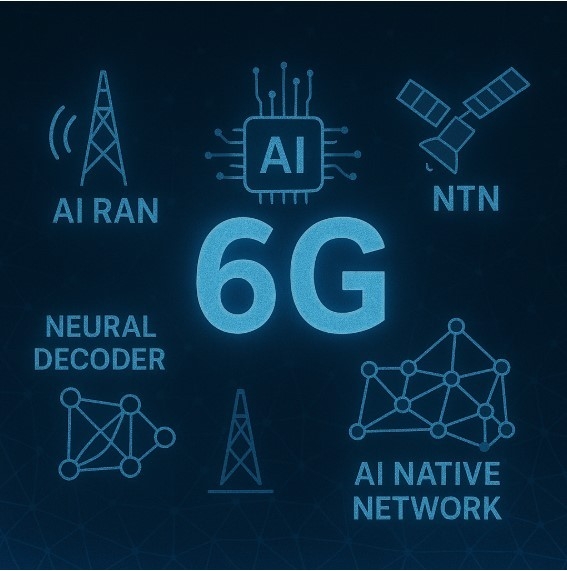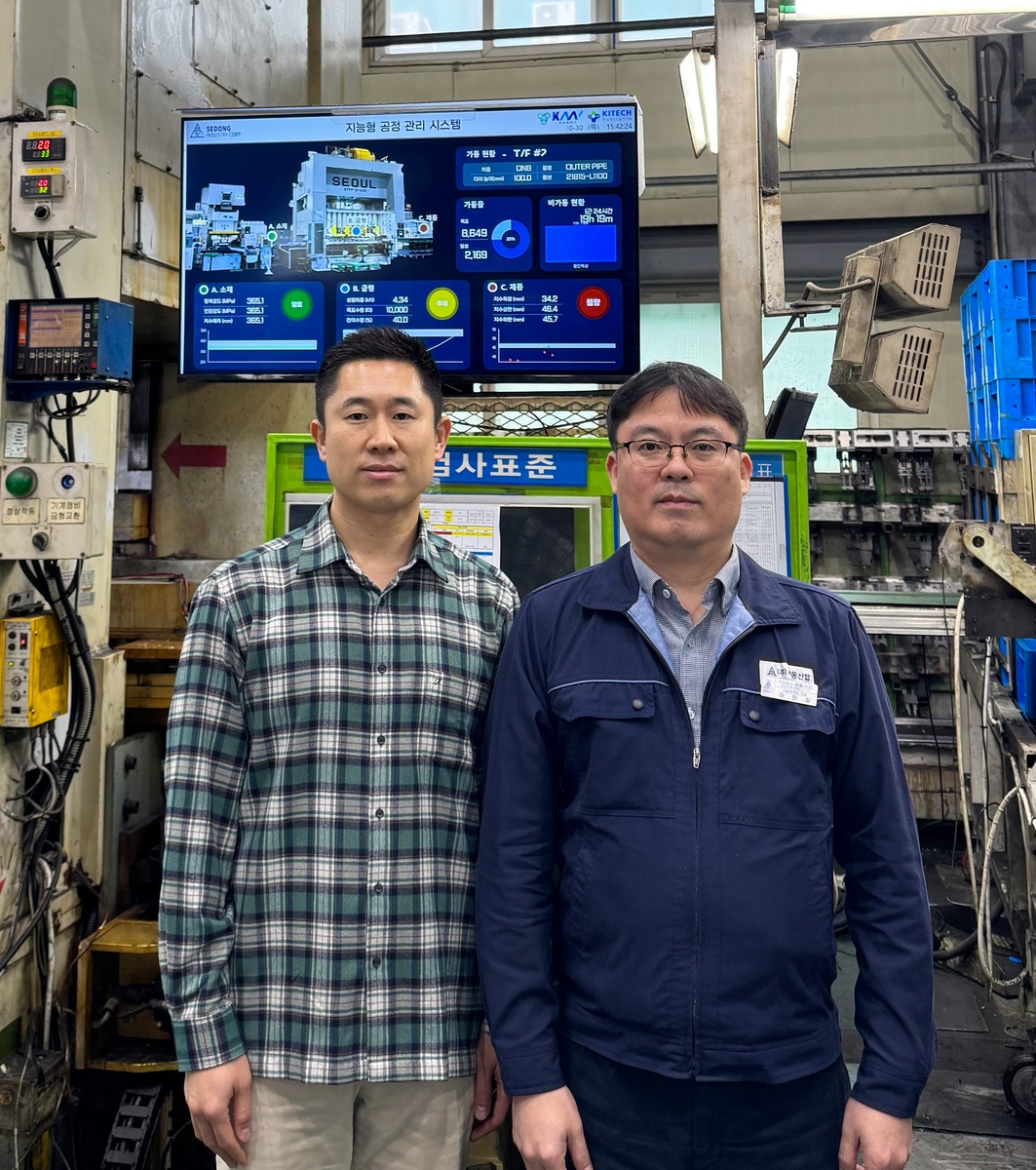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 이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각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방법과 한계점은 무엇일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추형석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29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공지능 연구의 성공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기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그는 딥러닝에서 중요한 것은 노하우와 데이터라고 강조한다.
알파고, 구글 등 인공지능 성공 사례
먼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 등 기존 기업들의 성공 노하우를 분석해보면 이들의 기술력은 이미 높은 수준까지 와있다.
알파고는 바둑에서 승리하기 위해 프로기사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착수하는 지점을 학습해 온라인 바둑서버에서 6~9단 기보 16만 개를 학습했다. 이를 학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3주. 프로바둑기사가 1년에 둘 수 있는 대국을 1000회라고 한다면 무려 160년이 소요되지만 알파고는 순식간에 바둑의 정수를 학습했다.
알파고는 정책네트워크와 가치네트워크로 학습을 했다.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프로바둑기사의 선호도를 학습하고, 스스로 경기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가치네트워크 학습을 통해서는 바둑판 상태의 승률을 계산했다. 대국에서 정책네트워크는 특정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 중 가장 승리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안했고, 가치네트워크는 현재 대국상황의 승산을 나타낸 것으로 승산이 정확할수록 많은 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컨트롤 했다.
추 연구원은 "알파고는 알고리즘 차원에서 새로운 것은 없고, 기존에 있었던 연구결과들을 조합해서 최상의 성능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알파고의 기술에 대해 평가했다.
알파고 뿐 아니라 구글의 검색엔진, 페이스 북 등에서도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구글의 검색엔진에서도 인공지능이 사용된다. 2013년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인 Hummingbird는 검색 질의를 자연어로 처리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했고, 2015년 Rankbrain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고 있다. 검색에서 지능적 검색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필요성도 더욱 부각된다. 예를 들어 재규어를 검색했을때 자동차 재규어를 보여줄 것인지 동물 재규어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검색엔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많이 알려진 IBM의 왓슨도 자연어 처리 딥파싱 기술로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한다. 현재의 왓슨은 공개 AP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대됐다. 의료진단, 여행, 쇼핑, 데이터분석, 구직지원, 로봇, 상담, 금융, 요리 등 지능형 분석으로 응용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
페이스북의 경우 얼굴인식 시스템에 딥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약 400만장의 이미지를 사용해 얼굴을 인식하는 시스템인데 딥페이스의 신경망은 9층으로 이뤄졌으며, 약 97%의 정확도로 얼굴을 인식한다.
kaggle.com의 의료분석 기술도 성공사례로 꼽힌다. 우선 녹내장 여부 판단은 85%의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는 전문 의료진이 사진만으로 판단할 경우 약 83%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의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여 분석 능력이 인정받고 있으며 심장병 진단을 위한 혈액량 예측도 정확한 수준이다.
추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의료에 응용되는 것은 의사가 없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미지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으로 질병 예측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딥러닝 한계점은?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인공지능 성공의 원동력은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파워, 공개소프트웨어 등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핵심 기술로 머신러닝을 꼽고 있으며 사람처럼 학습하는 원동력인 딥러닝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딥러닝 구현은 데이터 확보와 신경망 구성에 대한 노하우가 요구돼 어렵다. 데이터의 경우 양이 많을 수록 학습효율이 증대되고, 적으면 일반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게 문제다.
또 은닉층의 개수가 문제가 되는데, 층이 많을 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은닉층의 개수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정립이 없어 신경망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요구된다. 이에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경험적으로 먼저 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고층 신경망의 학습은 고성능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문제다. 알파고의 경우 130층의 신경망으로 구성됐고, 2015 iMAGENET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마이크로소프트는 150층을 사용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고성능컴퓨터를 확보하려면 수십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 연구원은 "딥러닝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도구로써 각광받는데 문제를 딥러닝으로 해결하는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많이 테스트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연구개발에 진입하면 초기에는 힘들어도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딥러닝은 아이디어 실현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전히 진입장벽은 존재하지만 많이 낮아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은 현재 지능이나 직관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순전히 계산하는 수준"이라며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걱정에 앞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지혜 객원기자
- xxxxxxx777@nate.com
- 저작권자 2016-05-02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