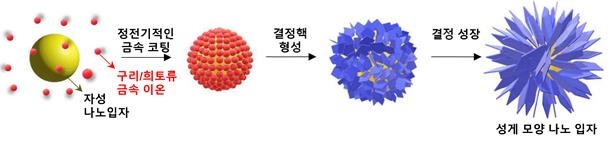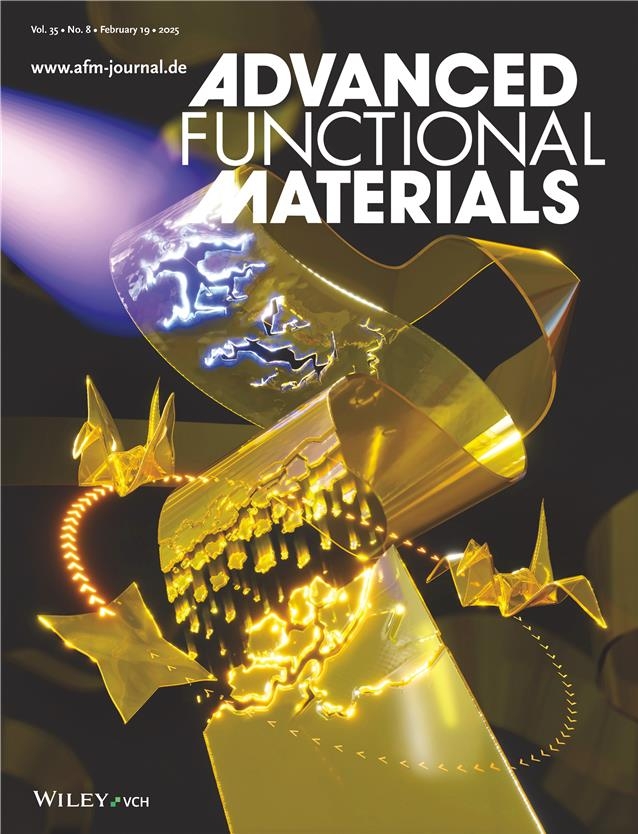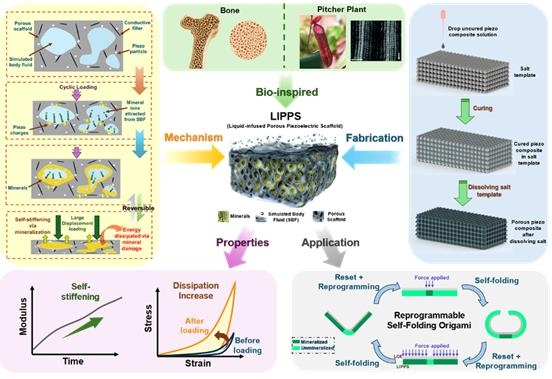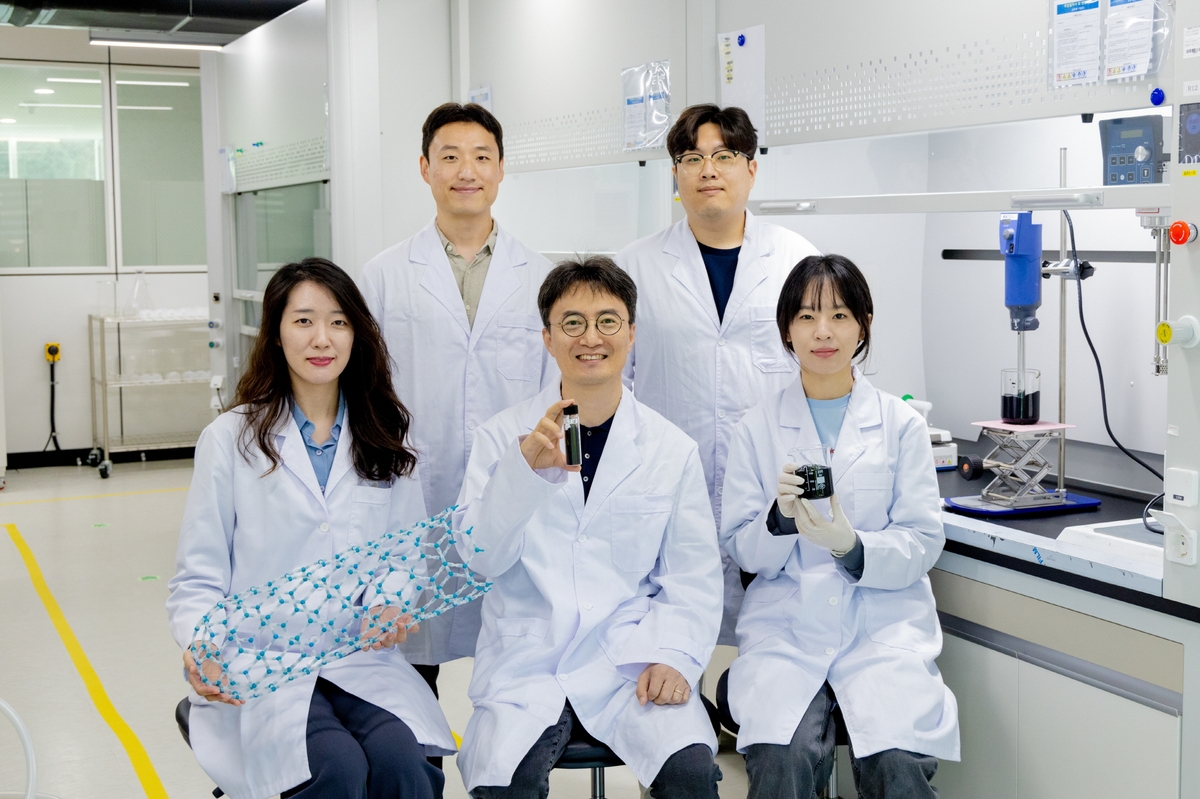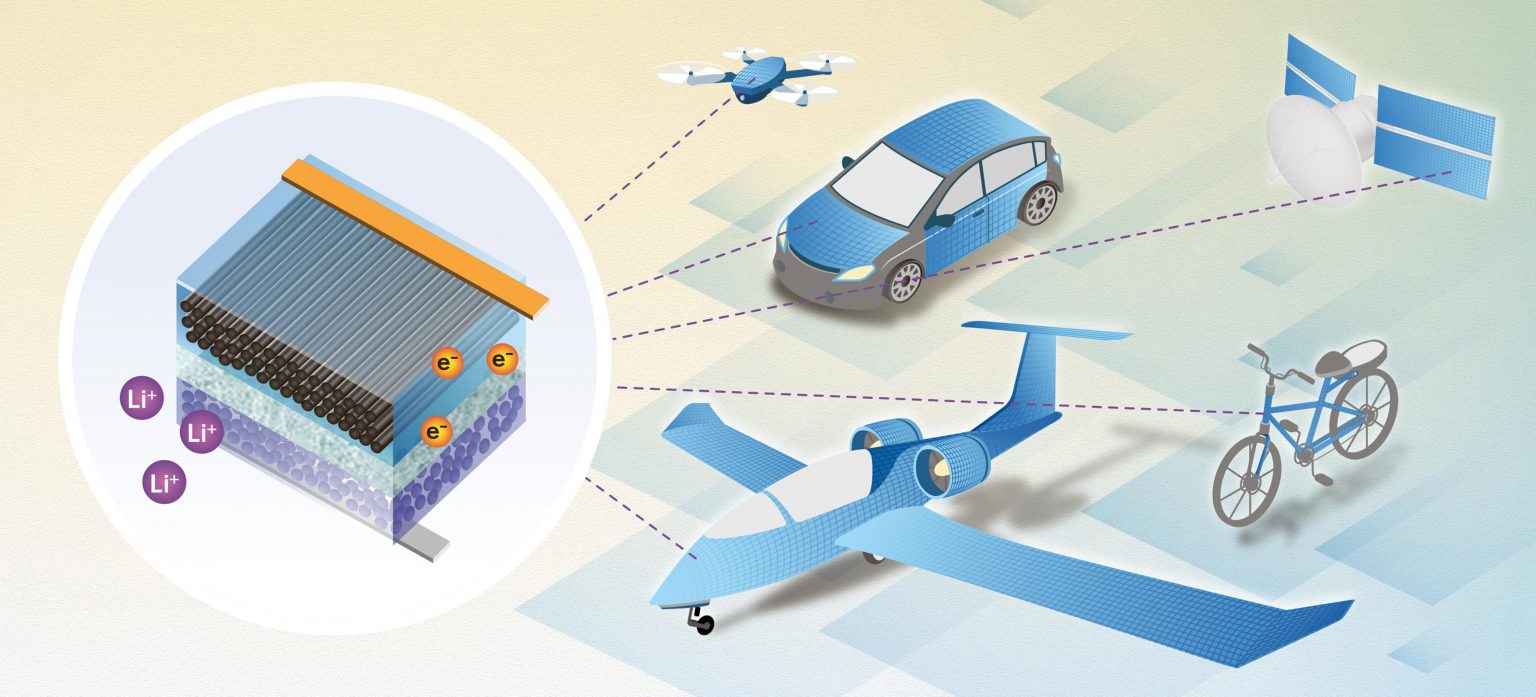반짝이는 광섬유 가닥들이 아치형의 포물선을 그리는 샹들리에는 낯설지 않았다. 우리 전통 가옥의 처마에서 볼 수 있는 유려한 곡선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포물선을 그리는 힘의 균형은 중력에서 찾았다.
중력과 신소재, 동양 전통 문화의 결합. 이 새로운 조합에 유럽이 열광했다.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노일훈 작가는 과학적 소재를 전통적 기법으로 엮어 예술작품을 완성했다. 그의 새로운 예술 세계는 영국을, 이탈리아를, 프랑스를 차례로 매혹시켰다.
자연을 모티브로 과학적 소재로 전통의 미를 더하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노일훈 작가의 개인전시회 ‘물질의 건축술’이 전시되었다.
그의 이색적이면서 새로운 창작품들은 관람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기존의 예술작품에서는 보기 어려운 색다른 멋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일훈 작가는 학창시절을 영국에서 보내고 유럽의 대표적인 건축학교인 런던 ‘AA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가구 박람회를 통해 차세대 혁신 디자이너로 주목받으며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이 후 올 해 6월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가 그의 작품을 소장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건축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융합 활동이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 세계는 색다름이 가득하다. 그는 탄소섬유와 광섬유라는 신소재를 우리 전통 공예법인 지승공예를 활용해 일일이 손으로 꼬아 완성시켰다. 작품의 모티브는 자연의 기하학적 구조에서 따왔다.
퐁피두 센터가 선택한 작품 ‘라미벤치(Rami Bench, 2013)’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라미' 시리즈 중 하나이다. ‘라미(Rami)’는 나뭇가지가 갈라지며 뻗어 나간다는 의미의 ‘Ramify’를 어원으로 한다.

중력, 자기장, 번개, 생명체 등 자연에서 찾은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
그는 자신의 작품에 중력을 대입해 상상하길 즐긴다. ‘라미’는 식물의 생장력을 상징한다. 생장력은 지구의 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물이나 식물,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중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는 ‘중력’을 이용해 건축물을 완성했다. 가우디는 포물선을 뒤집는 형태가 중력에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는 것을 10년에 걸친 실험을 통해 알아냈다.
노일훈 작가도 가우디와 같이 과학적 힘의 균형을 포물선에서 찾았다. ‘파라볼라 샹들리에(Parabola Chandelier, 2017)’는 중력에 대한 상상력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노일훈 작가가 공상적 건축(Visionary Architecture)의 계보 가운데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와 프라이 오토(Frei Paul Otto)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러한 가우디의 예술 철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번개, 파도, 해안 침식, 지구 자기장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서 발견되는 패턴이 작품의 원천이다. 여기에 중력, 장력, 압축력과 같은 자연의 힘을 더해 상상력을 극대화시킨다.
거기에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첨단소재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수많은 테크놀로지 기법을 대입해,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디자인 세계를 개척했다.
탄소섬유 소재의 끈을 잡아당기고 꼬아 만든 곡면 그리드 사이에 광섬유를 가로질러 엮은 LED 조명 스크린 ‘노두스(Nodus)’나, 광섬유 가닥이 스테인리스 와이어와 중첩되어 진동하는 빛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파라볼라 파라디소(Parabola Paradiso)’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테크놀로지 기법도 새롭지만, 그의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를 엮어내는 솜씨였다.
씨줄과 날줄이 촘촘히 엮여야 옷이 되듯이 첨단 소재와 과학기술이 만난 작품에는 ‘인간다움’이 작품의 사이사이를 메꿨다. 그는 탄소섬유를 꼬아 끈을 만들고 끈을 정밀하게 설계한 3차원 직조기 사이를 수차례 교차시킨 후 잡아당겨 형태를 만들었다. 모든 작업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완성된다.
이렇게 수공예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일훈 작가는 “미래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인간이 할 일을 남겨놔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싱거운 답을 던진다. 우문현답이었다.
로봇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이 비정형 그림을 그리는 시대다. 앞으로는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예술을 구현할 때, 인간이 자연에서 예술을 발견하며 자연과 과학기술을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작가가 보여주고 있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7-09-19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