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가속화하면서 지구촌 각 국가들은 한층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식량 공급망을 통해 서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산 밀과 콩, 호주산 쇠고기, 중국산 각종 야채, 러시아나 남미 해역의 생선들을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식품의 처리나 저장, 운송수단 등 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교역이 활발해짐으로써, 한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제 것처럼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호 연결에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에서 식량을 수입하다 그중 한 국가에서 식량 수출을 중단하면 수입처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듯이, 전 세계에 걸쳐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세계 식량 공급망 시스템은 이 같은 잠재적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촌 하나로 묶는 세계 식량 공급망
미국 델라웨어대 지리·공간 과학과 및 작물·토양과학과 카일 데이비스(Kyle Davis) 조교수가 주도해 월간 식량 저널 ‘네이처 푸드’(Nature Food) 12월호에 발표한 새로운 연구는, 이런 종류의 환경 충격에서 식량 공급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과 향후 집중 연구할 영역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미국 럿거스대 공중보건대학원 샤우나 다운스(Shauna Downs) 조교수와 아메리칸대 환경과학과 제시카 게파트(Jessica A. Gephart) 조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식량 공급망 환경 붕괴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파악하고, 식품 공급망의 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후속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글로벌 식품 공급망을 식품 생산과 저장, 가공, 유통 및 무역, 소매와 소비 단계로 기술했다.
데이비스 교수는 “식품 생산 중단이 여러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유통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것인가?” 묻고, “지구 반대편 지역의 농업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집 앞의 식료품 가게에서도 그에 따른 영향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코로나19, 식량 공급망에 동시다발 영향 미쳐
이번 연구에서 다룬 환경 파괴에는 홍수와 가뭄, 극심한 더위 같은 기상·기후 문제뿐 아니라 자연재해, 해충, 질병, 녹조 같은 조류 피해와 산호 백화현상 등도 포함됐다.

데이비스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체 식품 공급망에 미친 전례 없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는 특히 시의적절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기능 방식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농작물을 수확할 계절의 일꾼 부족에서부터 근무자들의 질병으로 인한 육류 가공 공장 임시 휴업, 사재기로 인한 식료품점 재고 부족 등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결과적으로 식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스 교수에 따르면 연구팀은 식량 공급망의 생산단계에서 온도와 강수량 등이 주요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환경적 충격이 나머지 다른 단계에 끼치는 영향까지는 철저하게 연구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식품들에서의 생산 공급 중단이 궁극적으로 소비와 식량 안보 및 국민 영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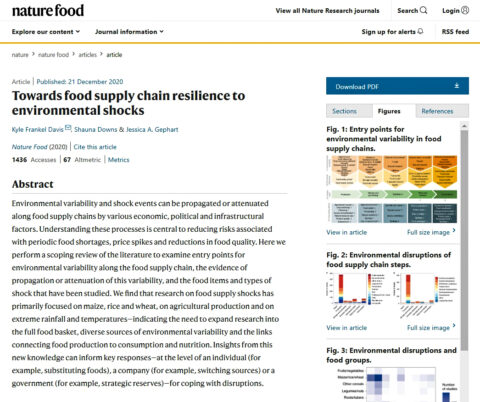
“식량 공급망에 충격 흡수할 탄력성 구축 필요”
이런 지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앞으로의 주요 연구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식별해 내기 위해 농민과 유통 업체, 소매점, 소비자들의 상대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공급망의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곳에서 가뭄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동시적인 충격이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어 세 번째는 밀이 부족할 때 옥수숫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는 것과 같이, 공급망 안에서 실행 가능한 대체 능력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 같은 작업들이 궁극적으로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로 하여금 식량 시스템을 더욱 잘 예측 가능하고 전례 없는 충격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 팬데믹 같은 갑작스러운 세계적 사건들이 식량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탄력성을 구축할 필요가 생겼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혼란을 흡수하면서 여전히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이르는 식량 공급망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병희 객원기자
- hanbit7@gmail.com
- 저작권자 2021-01-0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