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과학계는 긴장을 좀 풀 수 있게 됐다. 전자가 여전히 둥글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의 하버드, 예일,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최근 전례 없이 정밀하게 전자의 전하 모양을 조사, 완전하게 둥근 구형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생각보다 중대한 발견이다. 전하가 약간 찌그러져 있다는 것은, 전자의 존재에 탐지하기 어려운 미지의 무거운 입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노스웨스턴대에서 연구를 이끈 제럴드 가브리엘스(Gerald Gabrielse) 교수는 “만약 우리가 전자가 둥근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지난 수십년 동안을 통틀어 물리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견은 과학적으로 여전히 중요하다”며 “그 이유는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Standard Model)’이 옳다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18일자에 발표됐다.

‘표준 모형 결함 있지만 아직은 옳다’
표준 모형은 우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힘(강력, 약력, 전자기력, 중력)과 입자들을 구별하고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20세기 후반 세계 여러 과학자들의 공동연구로 개발돼 1970년대 중반 쿼크의 존재가 실험적으로 확인됨으로써 완성됐다.
그러나 표준 모형은 힉스 입자와 관련한 미세조정(fine tuning) 문제를 비롯해 중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소립자들이 주고 받는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 양자중력이론의 하나인 초끈이론(superstring theory)이 나왔다. 초끈이론은 수학에서는 잘 설명되나 물리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적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주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물질과 법칙을 연구하는 입자물리학은 극미세 분야에 대한 실험을 거듭하면서 이를 통해 거시적인 우주의 구성을 유추하고 있다.
입자물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어떠한 진공도 실제로는 완전하게 비워지지 않은 것임을 밝혀냈다. 별들 사이의 빈 공간(emptiness)이든, 분자 사이의 빈 공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는 모든 형태의 아원자 입자와 그에 대한 반물질이 끊임 없이 튀어나오고 사라지며, 접촉하면 서로를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일정한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되는 전자, 즉 둥근 음전하에 영향을 미친다.
초대칭이론(supersymmetry)과 통일장(grand unification) 개념을 포함한 많은 이론들은 ‘연구자들이 전자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구형의 전하가 약간 찌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몇몇 아원자 입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이렇게 하려면 지구 크기의 구형을 원자 두께의 정밀도로 측정하는 것과 같은 극미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바로 이런 수준과 가까운 실험이 수행됐다.
이 연구는 노스웨스턴대 가브리엘스 교수를 비롯해 하버드대 물리학과 존 도일(John Doyle) 교수, 예일대 물리학과 데이비드 드밀(David DeMille) 교수가 주도했다. 세 과학자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지원하는 ACME(Advanced Cold Molecule Electron) 전기 쌍극자 모멘트(EDM) 검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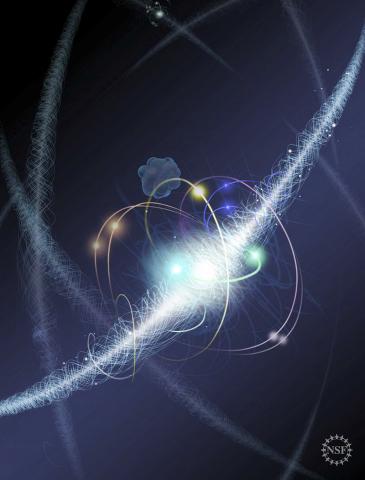
“표준모형 대안 이론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ACME팀은 연구를 위해 큰 책상 크기의 방에 차가운 산화 토륨 분자 빔을 발사한 다음 분자에서 방출되는 빛을 조사했다.
빛을 비틀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팀은 빛이 비틀어지지 않았을 때 전자의 모양이 실제로 둥글다는 결론을 내리고 표준모형의 예측을 확인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은 가상의 무거운 입자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입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이 입자들의 속성은 이론가들이 예측한 것과는 다르다.
예일대 드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계에 몇몇 대안 이론들을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CME팀은 2014년에 간단한 장치로 동일한 측정을 수행한 적이 있다. 이번 실험은 그에 비해 더욱 향상된 레이저 방법과 다른 레이저 주파수들을 사용해 훨씬 더 민감한 규모로 실시했다.
가브리엘스 교수는 “만약 전자가 지구 크기라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여기서 지구 중심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100만배나 짧은 거리만큼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이를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브리엘스와 드밀, 도일 교수팀은 연구장치가 더욱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자들이 이번 발견과 반대되는 증거를 찾을 때까지, 전자는 둥근 모양이라는 사실과 우주의 미스터리는 계속 남아있게 됐다.
가브리엘스 교수는 “우리는 표준모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실제로 틀린 곳을 찾을 수 없었다”며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스터리를 푸는데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은 매우 조심해야 겠지만, 우리가 그 수준의 정확도에 점차 근접해 가고 있다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김병희 객원기자
- hanbit7@gmail.com
- 저작권자 2018-10-18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