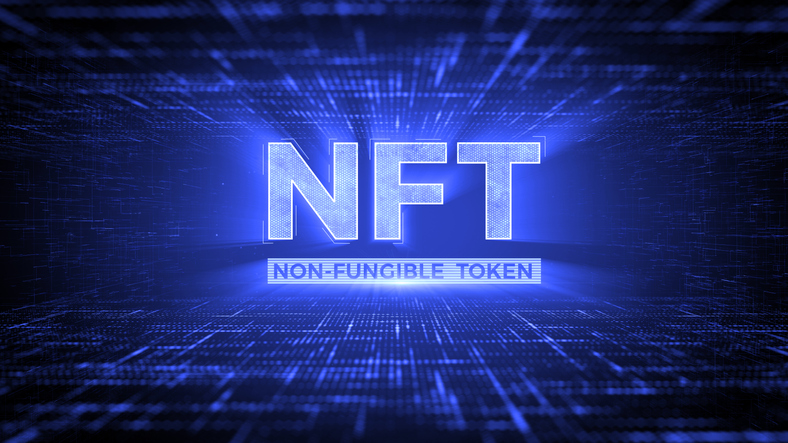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 민주당 후보는 “언제가 곧,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깨주길 바란다”며 대선 패배 수락 연설을 했다. 그는 여성 최초로 미합중국 대통령 후보로 나서며 유의미한 선거 결과를 냈지만 결국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의 상징인 미국사회에서도 여전히 너무나 견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며 자신이 그 천장을 깨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과거 수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하며 현재 여성의 위치를 쌓아올렸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남성중심이라는 견고한 벽이 존재한다. 과학 기술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슈엔 양(Xueyan Yang) 중국 시안교통대 교수는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젠더 분리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하다”고 분석하며 “여성들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심각한 실종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중·일 여성과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중·일 과학기술계에서의 젠더 이슈를 논했다. 이 날 슈엔 양 교수는 중국 주요 대학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며 과학계에 본격적인 젠더 이슈를 제기했다.
한·중·일 과학계 존재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
“중국 과학계에서 여성 과학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슈엔 양 교수는 중국 과학계에서 여성 인력들이 심각하게 사라지고 있고 그 중 극소수만이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동안 중국 과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라지는 여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취동기의 젠더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엔 양 교수는 “중국 과학계 여성들은 성취동기의 저하가 심각하며 이는 여성들이 과학계에서의 경력개발에 전념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과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갖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적으로 여겨지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성공을 두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젠더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었다고 양 교수는 밝혔다.
이러한 두려움의 원천은 사회적 환경에 따른 영향력 때문이었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부모님이 가진 경력개발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 “여성들은 시각적 공간 인식과 수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성취동기가 약하다”, “과학기술은 남성이 주도하는 문화”라는 등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젠더 고정관념이 이들의 성취동기를 크게 꺾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슈엔 양 교수가 젠더 고정관념에 의한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실종’ 원인을 연구결과로 나타내었다면 일본은 비슷한 동양 문화권에서 여성 인력들이 ‘약진’하고 있는 부분을 고찰하며 다소나마 과학계에서의 희망을 엿보게 했다.
일본 토호쿠 대학의 나오미 시바사키-기타가와 교수는 일본 내 STEM 분야 96개 학회 연합(EPMEWSE)이 4~5년 주기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과학계에도 유리천장,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 깨는 것 부터 필요
2007년에 비하면 2015년 일본 여성 과학 인력은 생명과학분야에서 15%이상 증가했지만 정보처리 및 공학계열에서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5% 미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은 약 7%에 불과했다. 여성 리더급(임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오미 교수는 “하지만 생명과학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20%가 넘었고 이는 여성 임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고 있다”며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는 “대체로 여성 비율이 20%는 넘어야 여성 임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여성 과학 인력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박사 학위 취득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연구기관 및 대학교 내에서 상위직급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일본 과학기술계에 성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남성의 직무분포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았다. 나오미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분포지수 간격은 점차 좁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며 연구수치를 토대로 희망을 전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 박철승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 과학자 비율은 16%에서 18.9%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가는 했지만 많은 지원에 비해서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을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떨어지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연구과제는 42%가 여성에게 주어졌지만 고액 연구과제인 리더연구는 2.5%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단장은 “생명과 의료 분야에는 여성 인력 비중이 30%에 달하지만 ICT 관련 분야는 10%에 불과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 따른 성별 편차도 여전하다"며 "이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세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여성과총) 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관련 학회나 단체의 지도자 그룹에 여성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과학계 여성 인력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7-10-23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