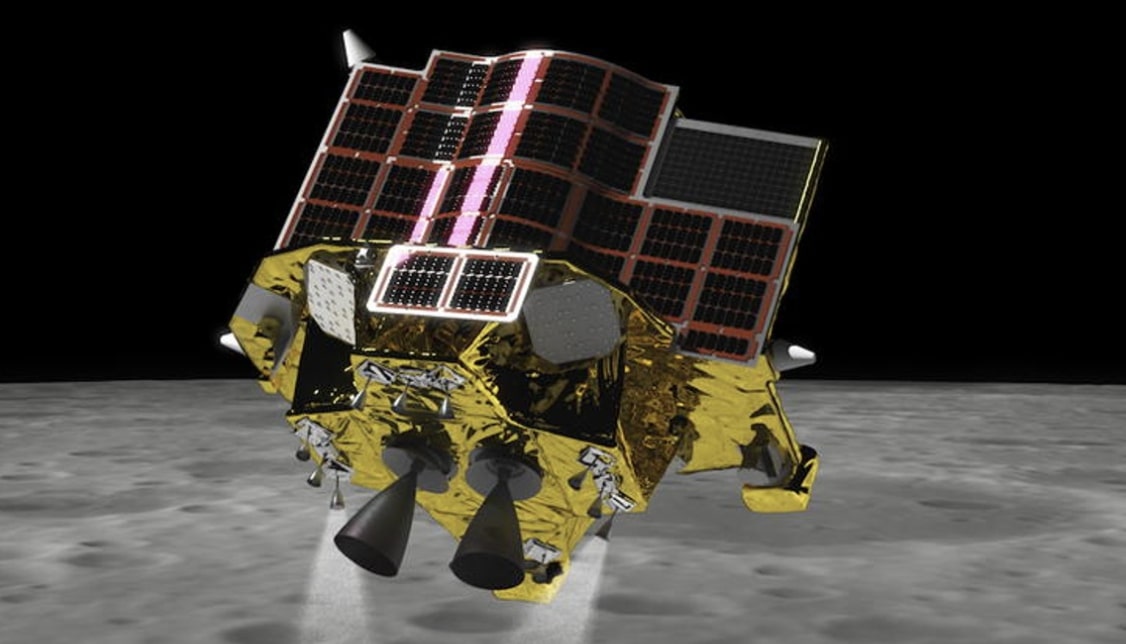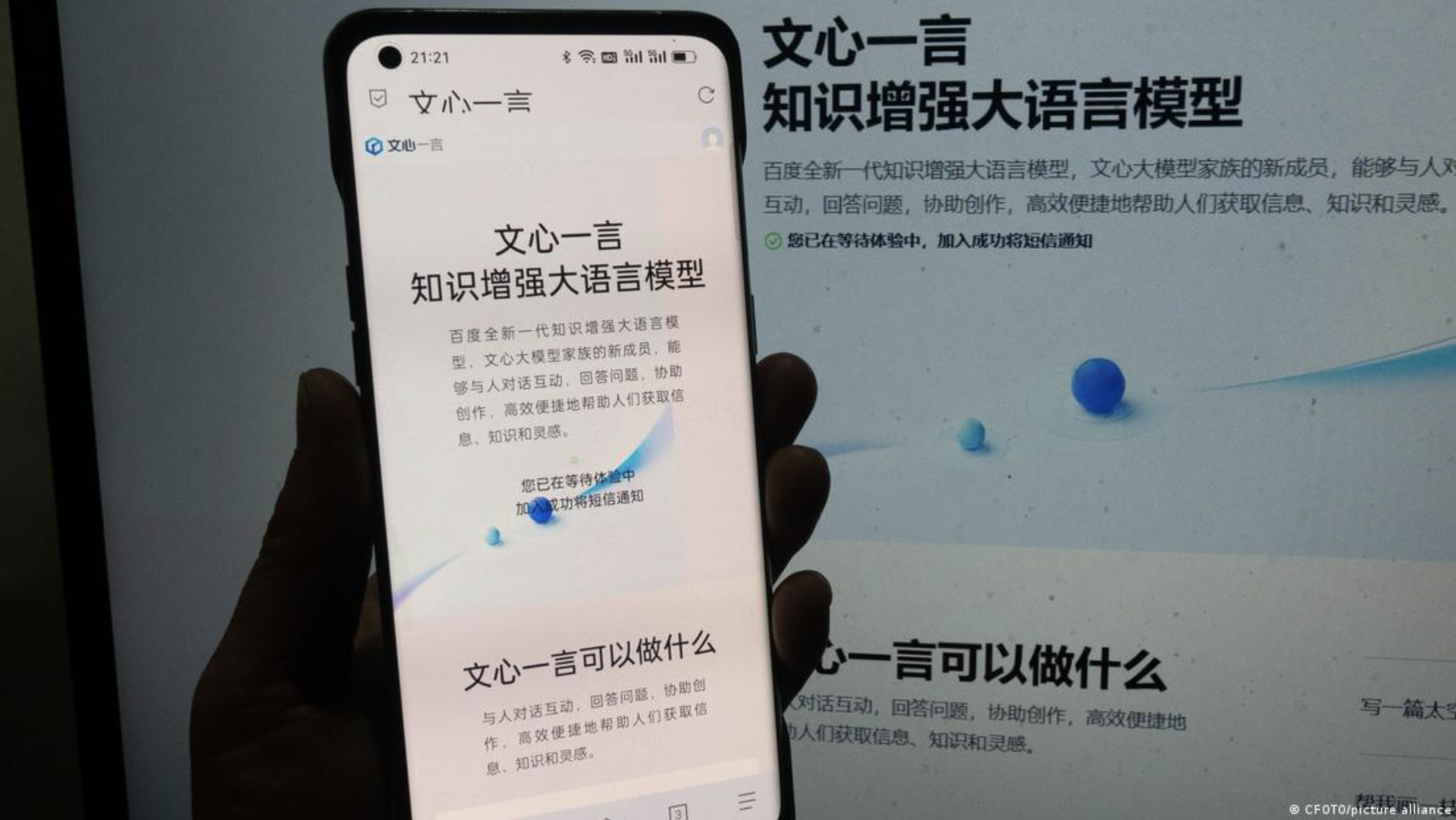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발달이 눈부시다. 중국은 IT, 바이오, 우주, 항공, 원자력, 해양, 신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 과학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과학문화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문화가 특정 계층을 벗어나 전 국민으로,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문화에 대해 윤대상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 교수는 “과학을 문화와 관광으로 연계시키고 농촌을 신형 과학문화보급 거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과학문화 해외사례 세미나’에서 규모의 과학을 이루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과학문화에 대해 조망했다.
양적 규모에 이어 질적 향상 꿈꾸는 중국의 과학문화
중국의 과학문화 기조는 과학관에 응축되어있다. 대륙답게 ‘규모’가 남다르다. 2015년 기준 중국 내 500평 이상의 과학보급 장소는 무려 1873개소에 달한다.
이는 과학전문 박물관 380개소 및 천문대, 수족관, 표본관, 자연과학계 박물관 등 광의의 박물관에 포함되는 과학기술계박물관과 청소년과학관을 포함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의 과학문화 활동의 중심에는 중국이 야심차게 건립한 ‘광동 과학관’이 있다.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광동과학관(Guangdong Science Center)은 부지면적 45만㎡, 건축면적 13.8만㎡, 전시면적 8만㎡로 단일 과학관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부지·건물·전시 면적을 자랑한다.
지난 2008년 개관한 광동과학관은 총 8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학술 교류, 과학 투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기능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거대한 4개의 과학 극장과 10개의 상설 전시실, 야외탐험 공원, 과학전시회장을 마련해 중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중국의 과학관은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1987년도부터 1995년까지 200여 개 과학관이 설립되었으나 내실이 없었다. 이후 200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과학관은 혁신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윤 교수는 “중국은 2002년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보급법’을 통과시키며 과학기술보급 업무를 강화하고 과학을 문화, 예술로 확장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이후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과학문화가 크게 성장했다. 이때부터 일반 대중들에게 과학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박물관 및 과학관 건립에 많이 투자하기 시작한 것.
대중들의 이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입장료도 받지 않았다. 이후 2015년까지 전국 92개의 과학관을 단계적으로 무료 개방했다.
소수민족, 빈곤층 향한 중국의 과학문화 방향
중국은 한족 외에 만주족, 몽골족, 조선족, 위구르족 등 55개 소수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국가다. 이들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 중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문화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소수민족들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을 향해있다는 점이다.
윤 교수는 “중국은 기존 중국의 전통문화와는 다른 언어와 생활방식을 가진 5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거주지를 보호지역으로 만들고, 그들만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몽고 박물관(內蒙古 博物館)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과학문화 정책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과학관이다.
후허하오터 시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내몽고 박물관은 몽골족의 짙은 민족적 특색을 잘 나타낸다. 몽고 전통의 유물 및 의복 등 몽골족의 문물은 물론 내몽고 지역에서 발굴된 공룡화석들과 다양한 몽골 부족들의 문화를 다룬 역사 전시실도 잘 보존해 놨다.
또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과학 유적을 문화와 교육,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꾸몄다.
이러한 과학문화정책은 과학기술보급을 전체 대중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윤 교수는 “과거에는 특정계층에만 과학정책을 한정적으로 시행했으나 점점 노동자나 빈곤층, 소수민족 등 전체 대중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과학문화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과학관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적 규모를 부풀리는 것을 중단, 구조를 최적화하고 품질향상에 힘쓰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중국 국민의 과학적 자질을 1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계는 여전히 중국의 과학기술과 문화 활동에 대해 폄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과학문화 활동이 멋들어진 외형에 비해 세부 콘텐츠가 부실한 탓이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빠르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타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보완하며 발전하고 있다.
윤 교수는 “우리는 중국의 과학문화 활동을 폄하하며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한 우물에만 있으면 안 된다. 외연을 넓혀야한다"고 국내 과학계에 조언했다.
- 김은영 객원기자
- teashotcool@gmail.com
- 저작권자 2018-10-31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