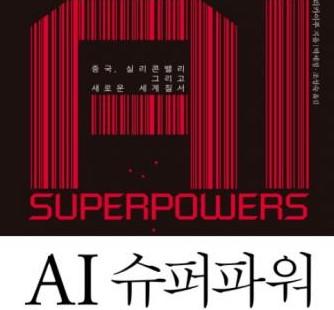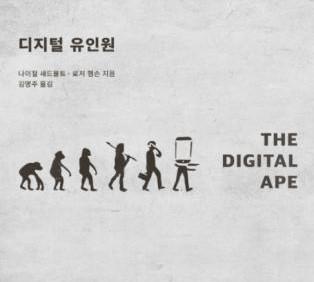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아주 깊은 뿌리에는 국산보다 수입산을 선호하는 심정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해외에서 이러저러한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만,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호기심이 크게 줄어든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런 편향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골프 같은 경기는 한국 여자 선수들이 너무나 뚜렷한 강세를 보이는데다, 눈에 보이는 기록으로 순위가 바로 결정된다.
그렇다면 과학 분야는 어떤가? 모든 국민들이 주문을 외듯 서로를 세뇌시키는 말이 있다. 연구비는 많이 사용하는데 성과는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언제부터인가 퍼지기 시작한 이 이상한 주문은 ‘창의성이 없다’는 후렴으로 뒷받침이 된다.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은 스포츠처럼 순위를 매기기 쉽지 않아서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런데, 등수를 매기고 상금을 주는 세계 경진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했다면?
다르파 로봇 챌린지 대회 2번 취재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 연구팀이 만든 인간처럼 생긴 ‘휴보’로봇은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DRC)’에서 세계 최고의 모든 팀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대회를 주최한 ‘다르파’가 어떤 곳인가? 다르파(DARPA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는 말도 안될 만큼,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미국 국방부 산하 조직이다.
‘휴보, 세계 최고의 재난구조 로봇’은 오준호 교수 연구실에서 만든 로봇 ‘휴보’가 2015년 DRC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 전승민 기자는 동아사이언스와 동아일보 과학동아 등에 과학기사를 쓰는 과학전문기자이다.
많은 과학기자들이 서울에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오준호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카이스트를 드나들었다. 카이스트 기자실을 나와 집에 올 때면 일부러 오준호 교수 연구실을 둘러오곤 했을 만큼 로봇에 관심이 많다.
전승민은 DRC대회가 열린 2013년 12월과 2015년 6월, 두 번 모두 미국 현지를 취재한 유일한 대한민국 기자이다. 이런 내용을 겨우 원고지 10여장에 소개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DRC우승이야 말로 ‘대한민국 공학기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순간’이라고 생각한 저자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등록해야 할 역사적인 사실’인 휴보의 우승 과정을 책으로 펴 냈다.
다르파 챌린지가 어떤 대회인지를 이해한다면, 오준호 교수의 우승이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르파 챌린지의 역할이 컸다.
다르파는 2004년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기계가 사막을 횡단’하는,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목표를 걸고 대회를 열었다. 첫해에는 아무 팀도 이 미션을 달성하지 못했다. 두 번째 해에는 몇 개 팀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를 지켜보던 구글은 우승팀을 스카우트 해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를 개발해달라는 미션 임파서블을 내렸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아닌 구글이 무인자동차 개발에 나선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바로 다르파의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난구조 로봇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전 세계의 어떤 로봇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다르파는 재난현장에 투입돼서 인간처럼 구조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팀에게 연구비 180만 달러, 우승상금 200만달러를 주는 DRC를 계획했다.
다르파의 명성을 아는 전 세계의 로봇전문가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이때 카이스트 휴보가 2013년 12월의 예비대회를 거쳐 2015년 6월 마침내 최종 결선에서 당당히 우승을 한 것이다.
사람닮은 구조로봇 후속 연구에 힘써야
그러므로 휴보 로봇 대회는 인간을 도와줄 도우미 로봇 개발의 시작을 알린 출발신호와 같다. 인류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는 기술적 공학적 발전은 ‘다르파챌린지’를 통해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왔다.
그리고 바로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민국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팀이 10년 넘게 만들어온 완전 토종 국산 로봇인 ‘휴보’가 차지한 것이다. 저자가 흥분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다.
구글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013년 12월의 예비대회에서 우승한 팀을 인수해서 자기 회사 우산밑으로 숨겨놓았다.
그래서 이쯤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과연 누가 움직이고 있기는 한 것일까?
- 심재율 객원기자
- kosinova@hanmail.net
- 저작권자 2017-02-16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