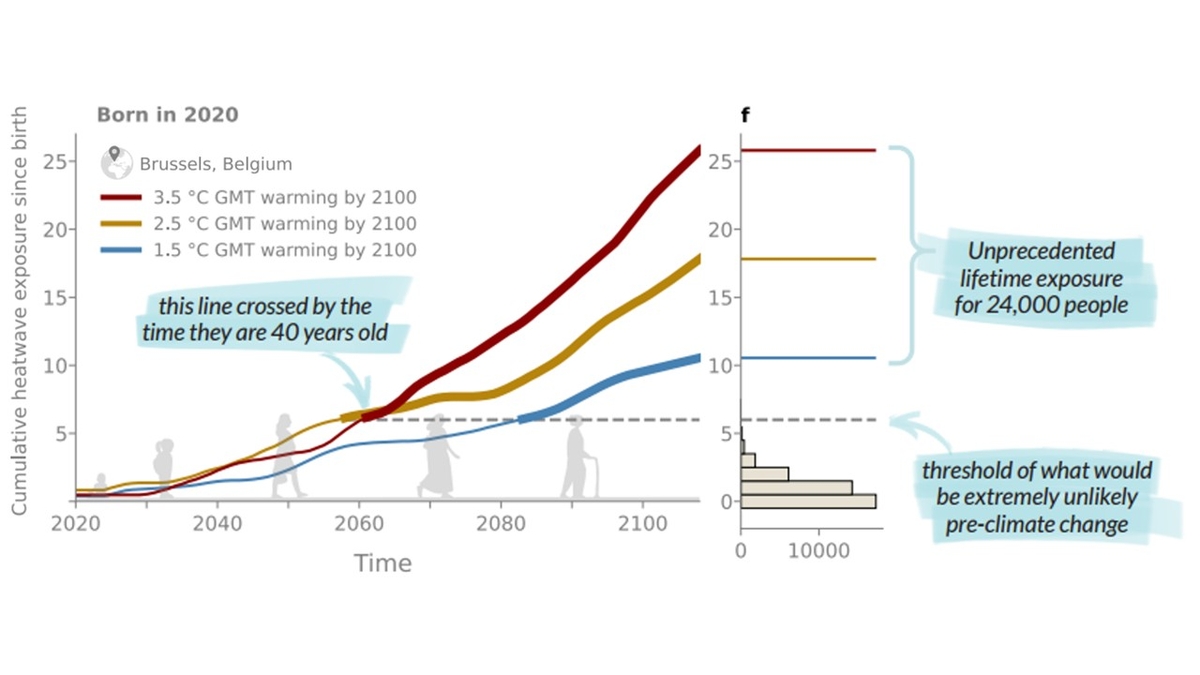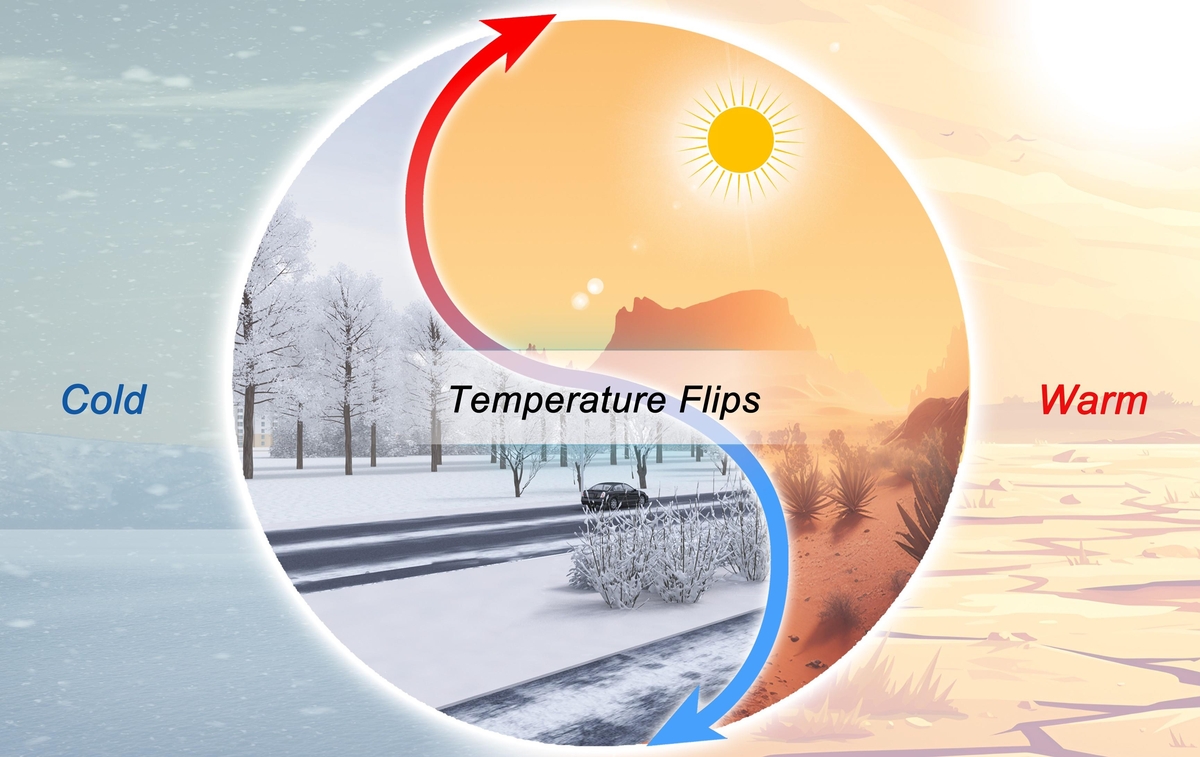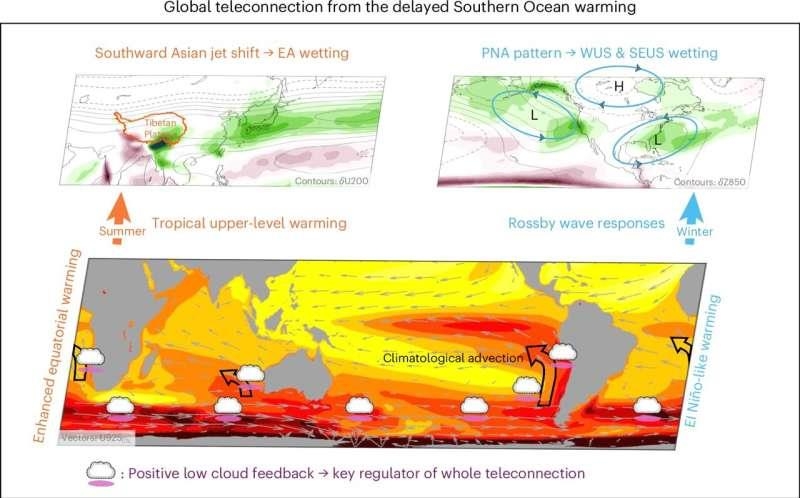산소가 거의 없는 바다 속에서 발견된 박테리아가 다른 생명체 분자들을 죽이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영역'이라고 불리는 지대를 더욱 암흑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산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양의 ‘산소 극소대역’(oxygen minimum zones, OMZs)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OMZs가 확대되면서 여러 학자들이 이에 관한 생화학적 과정과 지구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공대(GIT) 연구팀은 전세계 바다에서 가장 큰 산소 극소대역에 살고 있는 SAR11로 불리는 매우 증식성이 강한 박테리아 그룹을 발견하고, 이 박테리아가 바닷물에서 질소를 고갈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 과학저널 ‘네이처’(Nature) 3일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들이 지구의 영양 공급과 온실가스 주기에 충격을 준다고 설명하고, 이 박테리아의 유전자와 효소를 분석해 산소 극소대역에서의 탄소와 질소 주기 연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다 속 질소 줄어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극지방의 만년설이 녹고 북극곰이 죽어간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동안, 기후변화는 바닷물의 온도를 올리고 산성화시키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양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바닷물에서 산소와 질소가 줄어드는 것은 큰 퍼즐의 한 조각일 수 있다.
연구팀을 이끈 프랭크 스튜어트(Frank Stewart) 조지아공대 생물과학 조교수는 “질소는 인간에게 필수 영양소”라며, “모든 세포가 단백질과 DNA를 만드는데 질소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질소가 줄어들면 조류(藻類)를 비롯한 다른 유기체들이 자라기가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조류는 광합성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엄청난 탄소저장소로서 조류가 사라지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남겨진다. 이산화탄소 흡수가 차단될 때 지구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을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는 어떻게 질소를 고갈시키나
조지아공대 연구원들은 새로 발견된 SAR11을 비롯한 몇몇 다른 박테리아들이 산소가 없는 OMZs에서 질산(NO3) 호흡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다에서 질소를 고갈시킬 수 있는 화학적 고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스튜어트 교수는 “이 박테리아들이 질산염을 흡수해 이를 아질산염(NO2)으로 전환시킨 후 궁극적으로 가스형태의 질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 질소와 아산화질소(N2O)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질소가스들은 거품으로 빠져나와 결국 바다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생명체에는 좋지 않은 산소 없는 물이 만들어지고, 대기 중에는 질소와 특히 주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가 늘어나게 된다. 새로운 SAR11 박테리아군은 OMZs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독자적 박테리아군이어서 질소를 소실시키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대양에 산소가 없는 지대라니? 기후변화가 그 원인인가
산소 극소대역은 기후변화가 원인이 아니라 자연스런 현상이다.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빙하를 줄어들게 하는 것처럼 OMZs를 확장시킨다는 점이다.
OMZs는 대부분 열대지방 해안선 밖의 바다에 형성돼 있다. 이곳은 바람이 표층수를 밀어붙여 깊은 곳의 심층수가 올라온다. 이 물에는 영양분이 가득해 바닷말 같은 바다생물의 성장을 돕는다. 스튜어트 교수는 “궁극적으로 조류는 죽게 되고 천천히 가라앉는다”며, “박테리아가 그것을 먹고 그 과정에서 산소 호흡을 한다”고 말했다. 조류의 양이 많으면 박테리아가 소비하는 산소량도 엄청나 결국 물에서 산소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바닷물의 용존산소량을 줄게 해 OMZs를 확대시키고, OMZs가 팽창되면 탈질소작용이 가속화돼 질소와 온실가스, 영양분 등의 지구적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SAR11은 어떤 박테리아인가
SAR11 박테리아가 인간에게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며, 그 박테리아가 없으면 인간들이 굶주릴 수 있다. 이 박테리아들은 바다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어 지구의 식량 공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튜어트 교수는 “이 박테리아들은 분해된 유기 탄소(사체)를 먹고 사는데 이 박테리아를 좀더 큰 세포들이 먹고, 이 세포들은 다시 더 큰 플랑크톤들이 먹는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SAR11은 바다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 지구에 사는 살아있는 유기체 중에서 개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미경으로 보면 몸체가 짧고 약간 굽은 막대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SAR11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연구 결과 질산 호흡을 한다는 사실은 새롭고도 놀랄 만한 발견이다.
질산 호흡을 하는 새로운 SAR11종은 어디서 발견했나
연구팀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연구선을 타고 멕시코 칼리모주 태평양 연안의 세계에서 가장 큰 OMZ가 있는 곳에 도착해 바다 속 1.2m(4ft) 아래에서 물을 길어올려 박테리아를 포집했다. OMZ는 이곳의 바다 표면 300m(1000ft) 아래에 형성돼 있다.
이 때 포집한 새로운 박테리아는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유전체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SAR11 박테리아군의 하나로 밝혀졌다.
이번 발견은 과학적으로 왜 중요한가
이번 연구는 정당화된 과학적 의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과학자들은 SAR11 박테리아군의 적응력이 그리 좋지는 않다는 평판 때문에 가혹한 OMZ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종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스튜어트 교수는 “유전자를 변화시키자 매우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많은 박테리아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DNA 덩어리를 바꾸면 폭넓게 적응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연구원들은 OMZ에 있는 SAR11이 적응성을 잘 나타내지 않는 유전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도 박테리아가 실제로 얌전하게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연구진은 어떻게 의문을 풀었나
연구팀은 손상되지 않은 단독 세포로서 조심스럽게 포집한 15개의 새로운 박테리아종에서 유전체를 제거해 냈다. 그러자 거기에서 놀랍게도 질산 환원 효소 청사진을 발견했다. 이 효소는 박테리아가 산소 대신 질산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다시 박테리아의 질산 환원 유전자를 대장균(E.coli)에 집어넣어 유전자가 DNA를 이용해 효소를 생산하고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봤다. 기대했던 대로 효소가 만들어지고 잘 작동했다.
이번 연구 결과 SAR11이 산소 극소대역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적응과정을 거쳤는가가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이를 알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김병희 객원기자
- kna@live.co.kr
- 저작권자 2016-08-04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