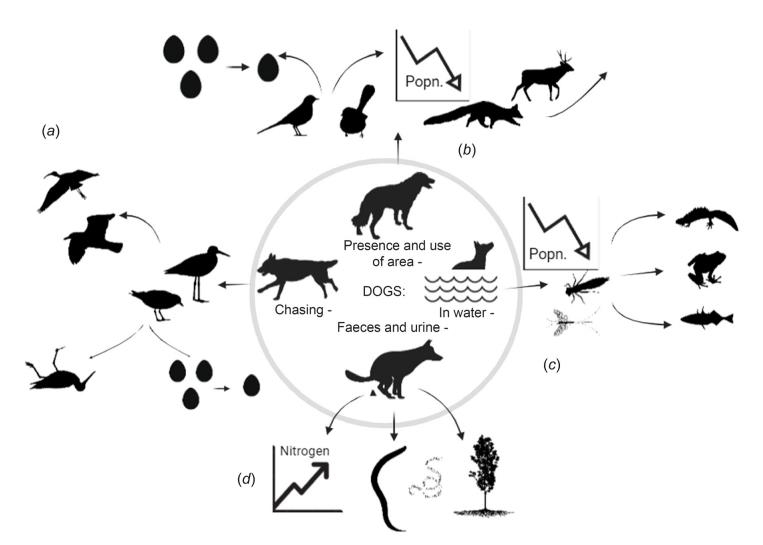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처음 주장한 나라는 1908년 영국이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잇따라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1940년대까지 아르헨티나,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칠레 등 여섯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가 지리적으로 더 가깝다거나 과거 남극 발견이나 탐험 성공 사례를 들어 남극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했다. 너도나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기구인 ‘지구 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이 중재에 나섰다.
태양의 흑점 활동이 극대화된 1957년부터 1958년까지 70개 나라가 지구 물리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구는 빙하학, 지진학, 측지학도 연구했는데, 이 연구를 위해 남극 대륙에서 국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1959년에 ‘남극 조약’이 채택됐다. 이 조약은 남극의 대륙과 바다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남극 안에서 누구나 과학 조사와 연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남극 대륙 평화 이용 조약이다.

칠레 등 지금도 남극 영유권 적극 주장
현재 5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조약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12개 원초서명국과 함께 과학기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지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28개 국가들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TCP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이라 한다. 이들 국가들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일명 남극조약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남극 연구를 시작했으며 1986년 세계에서 33번째로 남극조약에 가입했다. 1988년 2월에는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기지를 완공하고 18번째로 과학기지를 건설한 후 1989년 ATCP의 자격을 획득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풀지 못했던 영유권 분쟁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노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다. 그 중에서도 칠레는 남극에 칠레 주민을 거주케 하며 마리버드랜드(Marie Byrd Land)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서경 90∼150°, 남위 73∼85°에 위치한 이 지역은 99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곳이다. 연안부는 남극 대륙 중에서 가장 선적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내륙 부 역시 본격적인 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원 개발로 남극 협약 깨질 수 있어”
그러나 미국 해군에 의해 1956년 항공사진 촬영이 완료된 지역이다. 1957년부터는 해마다 월동 관측이 진행되고 있다. 3개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극조약의 최초 서명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영유권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강대국이 어느 시점이 오면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극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남극 자연을 보호하자는 협약이 자원 개발로 인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런던 대학의 지정학자인 클라우스 도즈(Klaus Dodds) 교수는 “남극에서 지하자원을 채취하지 말자는 합의가 어느 때고 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극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것.
1923년 영국 보수당의 레오 애머리(Leo Amery) 정무장관은 남극 전체를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칠레가 남극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칠레는 자국 영토와 가깝다는 이유를 노르웨이는 아문젠을 통해 남극 탐험에 성공한 국가임을 내세웠다.
1924년 들어서는 프랑스가 자국 탐험가의 남극 탐험을 이유로 남극 영유권 분쟁이 뛰어들었다. 양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숨겨진 이유는 남극 주변에 몰려오는 수염고래 때문이었다. 19~20세기 이 고래를 통해 생산한 기름은 중요한 원자재였다.
독일도 이 영유권 분쟁에 뛰어들었다. 24명의 승무원을 태운 선박 ‘MS 슈바벤란트(MS Schwabenland)’ 호가 당시 나치스를 상징하는 깃발을 내걸고 1939년 1월 남극에 도착해 퀸 마우드 랜드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1942년 들어서는 아르헨티나가 남극에 깃발을 꽂았다. 1947년에는 인접 국가인 칠레가 자체적인 남극 탐사를 시작한 후 피라다이스 만 근처에 남극 기지를 세웠다. 남극 선점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남극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트루먼 행정부는 미 해군을 통해 남극 개발 프로그램(United States Navy Antarctic Developments Program)에 착수하게 된다. 공식적으로 남극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남극기지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주의 관점에서 지구 관점으로 변화해야”
‘극지 저널(Polar Journal)' 편집자인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의 안네-마리 브래디(Anne-Marie Brady) 교수는 “남극 조약이 동서진영 간의 벌어지고 있던 냉전의 산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서방국가들의 조치였다는 것.
이 냉전 기간 중의 평화협정(남극 조약)이 자원부족, 기후변화,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 속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과학 탐사를 위한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점이다.
29일 ‘인디펜던트’ 지에 따르면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크릴새우 등 어족이 풍부한 남극해 탐사를 하며 산업에 활용할 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대 클라우스 도즈 교수는 협정을 통해 남극에서 탐사가 허용된 곳은 로스 해(Ross Sea) 영역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자원개발 경쟁은 이 기준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도즈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남극조약을 재해석하며 어족 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에게 남극이 특별한 지역이 아니며, 자국의 통치권과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터키를 비롯 이란, 벨라루스, 콜롬비아 등 또 다른 국가들이 남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이들 국가들은 과거 영어권 국가들이 주도해 만든 남극 조약에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교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한 남극 개발이다. “남극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로부터 격리돼야 할 유일한 지역”이라며 “남극을 기후변화, 종의 다양성 문제 등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연구 환경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7-03-30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