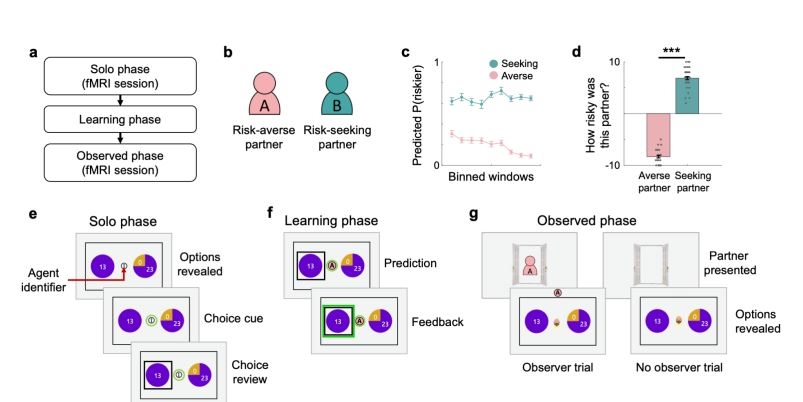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 72)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제49회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교수는 경제학계로부터 변방으로 인식돼오던 행동경제학(behaviroral economics)을 연구해온 인물이다.
행동경제학이란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 등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런 요인들로 인한 결과를 규명하려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한 주류 경제학과는 달리 행동경제학은 ‘합리적인 인간’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노벨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일러 교수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경제활동에 있어 의사결정(decision-making) 과정을 분석해냈다”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경제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지심리학으로 비합리적 심리 밝혀내
과학계 역시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이 경제학에 적용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인지심리학이란 과학적·기초적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이 지식을 획득하고 획득한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언어학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가 되고 있는 학문이다. 이 인지심리학이 경제학에 도입되면서 200여 년 동안 지속돼온 근대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8세기 근대경제학을 창시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1776년 출간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 앞서 1759년에 출판한 ‘도덕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에 따르면 ‘공감(sympathy)’이라는 인간의 비이기적인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공감’을 통해 경제활동의 공정성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 스미스의 ‘공감의 원리’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는 시장 원리로 확장된다. 반면 ’행동경제학‘에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세일러 교수는 ‘제한적 합리성(limited rationality)’,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 ‘자기절제 결여(self-control)’ 등 세 가지 심리적 관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시장성과(market outcome)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세일러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경제적으로 ‘제한적 합리성’ 속에서 살고 있다. 경제구조는 극도로 복잡해지고 있지만 인간의 대처 능력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 교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마음의 회계(mental accounting)’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마음의 회계’란 돈에 대한 행위를 평가·̒관리·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조작 행위를 말한다. 무의식적인 ‘회계 착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좁은 프레임을 만들어 그 틀에 맞추려는 행위를 말한다.
‘계획자-행동자 모델’로 인간 비합리성 증명
행동경제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탈러 교수는 또한 행동재무학(behavioural finance)의 창시자 중의 하나다. 인지능력의 한계(cognitive limitations)가 자산평가 등에 대한 재무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론이다.
세일러 교수의 두 번째 이론인 ‘사회적 선호’란 사람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평등 및 정의와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지 그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교수는 특히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이라는 경험적인 툴을 통해 소비자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관심이 가격구조 결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
‘독재자 게임’이란 행동 경제학의 대표적인 실험으로, 인간이 한정적인 경제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라는 고전 경제학의 이론을 반박하는 실험이다.
1986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의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을 발전시킨 것으로 각국의 다양한 경제상황에서 다양한 그룹 들 간에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 지속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인간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기절제 결여’란 새해가 될 때마다 시도되는 사람들의 결심이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는 원인을 말한다. 탈러 교수는 심리학자, 뇌과학자 등이 자주 적용하고 있는 ‘계획자-행동자 모델(planner-doer model)’을 통해 이를 증명하려 했다.
과학자들은 장기계획(long-term planning)과 단기 행동(short-term doing) 사이의 내적인 긴장관계를 분석하는 인지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이 ‘계획자-행동자 모델’을 연구해왔다. 탈러 교수는 이 방식을 행동경제학에 도입해 인간의 비합리성을 증명했다.
특히 단기적 성과에 대한 유혹이 건강한 삶의 패턴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교수는 또 부드럽게 조언하는 것 같은 행위인 ‘너징(nudging, 가벼운 개입)’이 연금저축 등 경제적 행위를 하는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노벨위원회는 “세일러 교수가 심리학 등 과학적인 방식을 경제학에 도입해 경제활동에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특히 교수의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통찰력은 새로운 분야인 행동경제학 발전에 중요한 기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노벨경제학상은 스웨덴중앙은행이 1968년 제정한 상으로 노벨상은 아니다. 공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중앙은행 경제학상이다. 그러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른 원칙에 의거해 스웨덴왕립과학원이 선정해 시상한다.
- 이강봉 객원기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7-10-10 ⓒ ScienceTimes
관련기사

 뉴스레터
뉴스레터